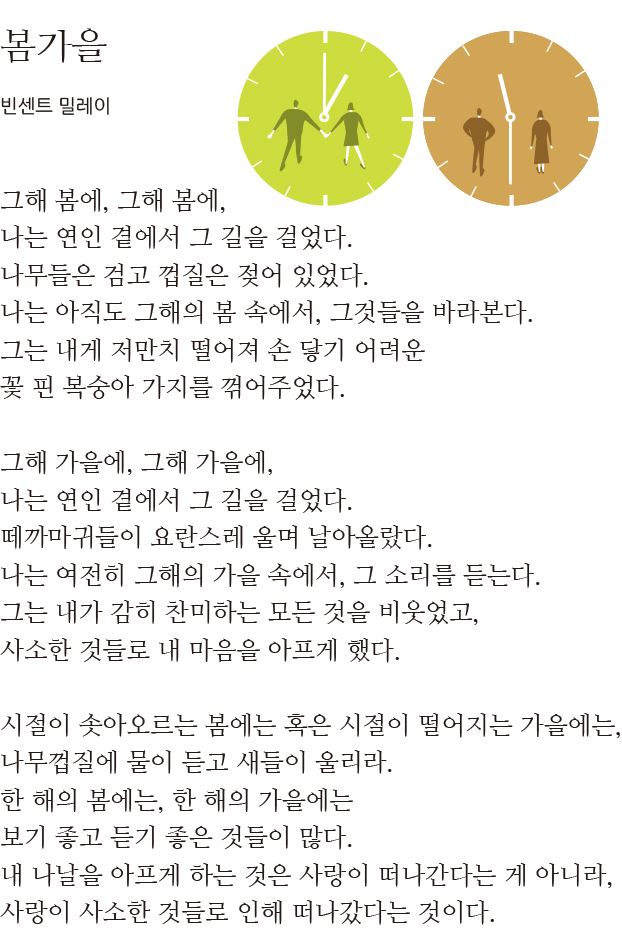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혼자가 아니지요. 우리의 곁에는 누군가 있지요. 조금 가까이 또는 조금 멀리에. 봄가을. 봄가을. 이런 둥근 중얼거림처럼요. 햇빛은 늘 사선이었는데 따뜻하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곁에서 걸어주는 사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존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봄에 연인은 손 닿기 어려운 꽃 핀 복숭아 가지를 꺾어주었지요. 내 얼굴이 온통 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을에 연인은 내가 감히 찬미하는 모든 것들을 비웃었으므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일상 또한 모두 사라졌지요. 그럼에도 나는 그해 봄 그해 가을이라고 부르는 지나간 봄가을을 여전히 보고 듣지요. 지나간 시간은 굳어버린 시간인데, 아직도 굳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도 움직이는 나의 곁이 되는 것이지요.
한 해의 봄에는 한 해의 가을에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들이 많지요. 사소한 것들로 사랑이 떠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내 마음과 나날을 아프게 한 사랑에도 훼손되지 않은 봄가을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이원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