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중품이 아닌 생명을 안고, 업고 함께 탈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뭉클했다. 게다가 동물과 함께 대피가 가능한 대피소도 있었다. 10년 전, 미국도 재해 때 동물과 함께 머물 대피소가 없었다.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재난이 생기면 인간만 대피하라’가 오랜 재난 지침이었다.
하지만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한 2005년의 미국은 인구의 70%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고 있었다. 낡은 제도는 바뀌어야 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피난을 거부했다. 결국 재난 시 동물도 함께 구조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 검찰은 이번 허리케인 재난 때 반려동물을 보호소에 버리거나 마당에 개를 묶어두고 떠난 사람들을 동물학대 죄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은 사람들의 책임감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된다. 2005년 카트리나 때는 폭풍우로 목숨을 잃은 주인을 5일간이나 지키던 푸들이 구조되기도 했다. 사람이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동물도 사람 곁을 지킨다.
우리나라도 평범한 일상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지진, 물난리 등 자연재해도 이어지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에 의해서든 인간에 의해서든 평범한 일상이 위협을 받으니 ‘생존 배낭 꾸리기’같은 기사에 눈길이 머물게 마련이다. 그래봤자 동물과 함께 하는 대피법은 나오지도 않지만.
자연 재해와 전쟁을 겪은 일본은 동물 관련 책에도 그들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반려동물과 사는 만화가는 정기적으로 동물과 대피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194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책에는 군인들에게 잡혀 갈까 개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한국의 개만 군수품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었다). 지금 만들고 있는 토끼 책에는 재난 시에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구하러 와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대피하지 않으면 동물은 죽는다’고 생각하라고 강하게 말한다. ‘나중은 없다’는 말이 와 닿아서 마음에 담아두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집은 대책이 필요 없어. 청와대랑 가까우니 한 방에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짐을 꾸린다면 아이들 용품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헤아린다.

엄마는 늘 말한다. “별 일만 없으면 행복한 거지.” 전쟁과 가난을 겪은 엄마 세대의 소극적 행복론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곁에는 고양이가 있었다는 작가 야마자키 마리는 ‘아라비아 고양이 골룸’에서 낯선 곳, 중동의 다마스쿠스에서 길고양이 골룸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의 유쾌한 시선과 새끼 고양이의 눈으로 본 중동의 생활사가 재미있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 관련 기사에 등장한 ‘다마스쿠스 포연, 테러, 공습’이라는 단어에 다시 이 책을 찾았다. ‘이 책의 배경이 시리아였던 거야?’ 싶어서 찾았더니 맞았다. 책에서 만난 중동의 이색적인 골목들, 사람과 고양이가 어우러진 그곳의 신선함과 떠들썩함이 전쟁 속으로 사라진 거다. 엄마의 소극적 행복론에 새삼 동의했다. 별 일만 없어도 행복한 거라는 엄마의 소극적 행복론, 전쟁만 없어도 평화라는 소극적 평화론과 같은 의미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도 평화가 절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어떤 이유로든 평화가 깨지면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와 동물은 더 불행해진다. 엄마는 “너희 세대에는 전쟁이 없어야 할텐데”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신냉전 시대가 돌아오는 듯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와 동물 가족에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참고한 책: 아라비아 고양이 골룸, 야마자키 마리, 애니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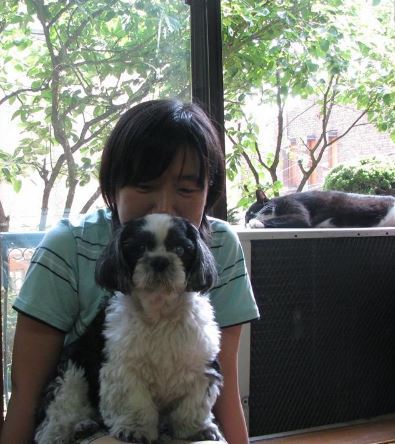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