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되어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짐을 부치는데 비행기 회사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스탄불 공항은 넓고 복잡하거든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한 시간이라고요? 직원은 친절하게도 이스탄불 공항에서 내가 갈아타야 할 비행기의 탑승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면서 덧붙였다. 제가 남은 좌석 중에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드렸으니, 내리기 전에 승무원에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먼저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직원은 나무랄 데 없이 친절했으나 나의 불안 초조 걱정 시작 단추는 이미 눌렸다. 솔직히 탑승 수속을 밟기 직전까지 나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네 시간쯤 머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네 시간 동안 ‘이스탄불’ 이라는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신비한 이국적 분위기를 만끽할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이국적 분위기를 맛보기는커녕 복잡한 공항에서 조금 헤매기라도 하면 갈아타야 할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덕분에 열 시간 남짓 날아가는 동안 비행 공포는 잊었다. 자칫 연착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난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요동을 칠 때도 “비행기야 날아라, 빨리, 더 빨리!” 하고 주문을 외웠다. 이륙하자 곧 식사가 나왔고, 조금 있으니 간식으로 피자가 나왔다. 착륙 예정 시간이 한 시간 반쯤 남았을 무렵, 또 식사가 나왔다.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고, 옆 사람과 팔꿈치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꼼짝 없이 앉아 있는 상태로 눈앞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밥만 먹고 있다 보니, 비좁은 우리에서 사육 당하는 가축들의 고통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주문의 효험 탓인지 비행기가 예정 시각보다 일찍 도착할 것이라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화장실 가는 길에 통로에서 마주친 승무원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승무원은 상냥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비행기 표를 왜 그렇게 끊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나를 향해 승무원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도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들이 모두 나가신 뒤에야 나가실 수 있어요.
좁은 통로를 비틀거리며 내 자리를 찾아 걸어오는데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는 승객들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예전에 눈 여겨 본 노예 무역선 그림이 떠올랐다. 400명이 정원인 배에 700명까지 싣기도 했다는 갑판 밑에는 선반처럼 층층이 칸이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발에 쇠고랑을 찬 노예들이 칸마다 통나무처럼 쟁여져 차곡차곡 실려 있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끔찍함이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노예선 정도는 아니잖아.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제대로 된 그릇에 담긴 식사가 나오고, 뒤로 젖히면 침대처럼 넓고 안락해지는 의자가 있다는 클래스에 속한 승객들이 보기에, 단지 효율적으로만 만들어진 이 좌석들은 그토록 끔찍할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이스탄불 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통로 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가 저쪽 클래스의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 달려 나갔다. 서둘러 걸으며 주위를 훑어보았다. 내가 경험한 공항들은 대체로 조명이 휘황찬란하고 바닥이 매끄러우며 고급 물건을 파는 상점들로 가득 찬 장소였다. 이스탄불 공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환승 수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탑승 시각 전에 여유롭게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나보다 많게는 다섯 배, 적게는 세 배쯤 비행기 삯을 더 내어 매우 중요해진 사람들이 먼저 비행기에 오른 뒤, 마침내 그다지 중요하지 못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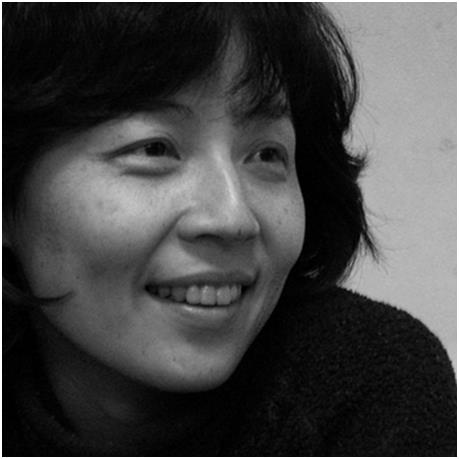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