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 약속한 바이오의약품
막대한 투자 가능한 기업 드물어
기존 화학신약과 지원책 조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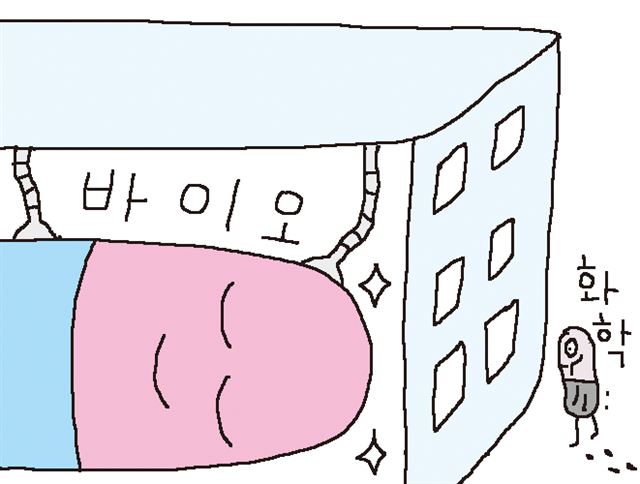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새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신산업의 하나로 바이오를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반길 것 같은 제약업계가 웬일인지 시큰둥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기술임은 분명합니다. 기존 화학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이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이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용하거나 주사하는데 수십~수백만원이 드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뜻 적용하길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력 있는 환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겠죠.
바이오의약품이 비싼 것은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물체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재계에선 삼성이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년 간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공장 건설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바이오의약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JW중외제약과 일본 쥬가이제약의 합작 벤처인 씨앤씨신약연구소가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갈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기존 항암제가 잘 듣지 않고 재발이 잘 되는 삼중음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듭니다. 화학의약품은 대개 바이오의약품보다 덩치가 작은데요.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표면 물질을 건드리는데 그치지만, 화학의약품은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그래서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광범위한 질병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되고, 삼중음성 유방암처럼 예외적인 질환이나 특이 증상 등에는 화학의약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1조원 넘는 기업이 2곳밖에 없는 국내 제약업계에선 삼성 같은 ‘규모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적지만 수요가 확실한 질병의 화학신약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가려지고 화려한 바이오에만 이목이 집중되니 씁쓸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 건수를 보면, 화학신약은 2005년 18개에서 2015년 3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바이오신약은 2개에서 12개가 됐습니다. 증가 폭은 바이오신약이 높지만, 여전히 화학신약이 3배 가까이 많죠. 무조건 ‘대세’를 따르기보다 바이오와 화학신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