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열리는 시 낭독회의 연출을 맡아 행사 준비로 경황이 없던 지난 금요일 오전 박상륭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꿈결처럼 전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아! 이럴 수가 있나.”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날 하루는 선생님에 관한 생각으로 내내 마음이 이상했다. 생전에 꼭 한번은 더 찾아 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러질 못하게 됐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주변의 박상륭 마니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오래 전부터 선생님의 작품이 뿜어내는 괴이한 마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세이도 아닌, 하지만 그 모든 문학의 장르를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포괄하는 선생님의 작품은 ‘명작’을 훌쩍 뛰어넘어 여간해서는 작품이 품고 있는 비밀에 근접하기 어려운 ‘괴작’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선생님의 작품이 문학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했다. 좋은 문학 작품을 연극 무대에 지속적으로 올려보고 싶었던 나는 선생님의 작품에 매료돼 있던 동료 연출가와 의기투합해서 생전의 박경리 선생님이 단편소설의 진수를 맛보려면 박상륭의 <남도> 연작을 꼭 읽어봐야 한다고 극찬하셨던 <남도 1>과 <남도 2>, <남도 3>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대 위에 계속해서 올릴 계획을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드라마투르기의 역할을 자임했다.
오랫동안 캐나다에 계시던 선생님이 서울과 일산에 자리에 잡고 일년에 한 번씩 봄과 여름 사이에 머물다 가시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다. 선생님의 새 책이 출간되면 광화문에 있던 선생님의 거처에 당대의 내로라하는 후배 시인들과 소설가, 평론가들이 모여들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선생님의 단골술집이었던 ‘영일만 친구’에서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여러 방면에 박학다식하셨고 특히 신화에 해박하셨던 선생님의 이야기에 흠뻑 취할 수 있던 그 자리는 선생님의 솔직한 성품처럼 소탈하고 따듯했다.
그러다가 사달이 난 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무렵이었고 때마침 <남도 3>을 무대 위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다. 문단의 많은 어른들처럼 선생님 역시 이상하게도 노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셨다. 광화문에 모였던 문단 후배들은 선생님의 노기 어린 목소리가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많이 불편했다. 연극 리플릿에 <남도 3>에 대한 작품 해설을 싣기로 했던 내가 선생님의 작품에 비판적인 견해를 붙이게 된 건 그런 연유에서였다.
공연을 보러 오셨던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못내 속상하고 서운하셨던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주셨다. 그런데 한번 만나자며 내게 섭섭함을 내비치던 당신의 음성이 참으로 부드럽고 의연했다. 공연 마지막 날은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작품 올리느라 고생했다며 연출가와 나를 불러 삼계탕을 사주셨다. “최 형. 난 최 형이 이 자리에 안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하시며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에서 군자의 기품이 느껴졌다. 선생님은 대인배셨다. 우주적 풍모를 띤 작품처럼 타고난 성정과 인품도 그만큼 너르고 깊었다. 글과 사람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허다한 문단에서 선생님은 글이 곧 사람임을 가르쳐주신 따르고 배우고 본받을만한 큰 어른이셨다.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과 다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들어가시던 선생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연락 드려야지 하면서도 선뜻 용기를 못 냈던 건 그만큼 부끄럽고 민망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선생님의 49재가 끝나고 사모님이 돌아오시는 즈음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을 흠모했던 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선생님은 급하게 가셨지만 선생님의 환한 웃음을, 문학과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남도의 사내’를 영원히 각자의 가슴에 품으려 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최창근 극작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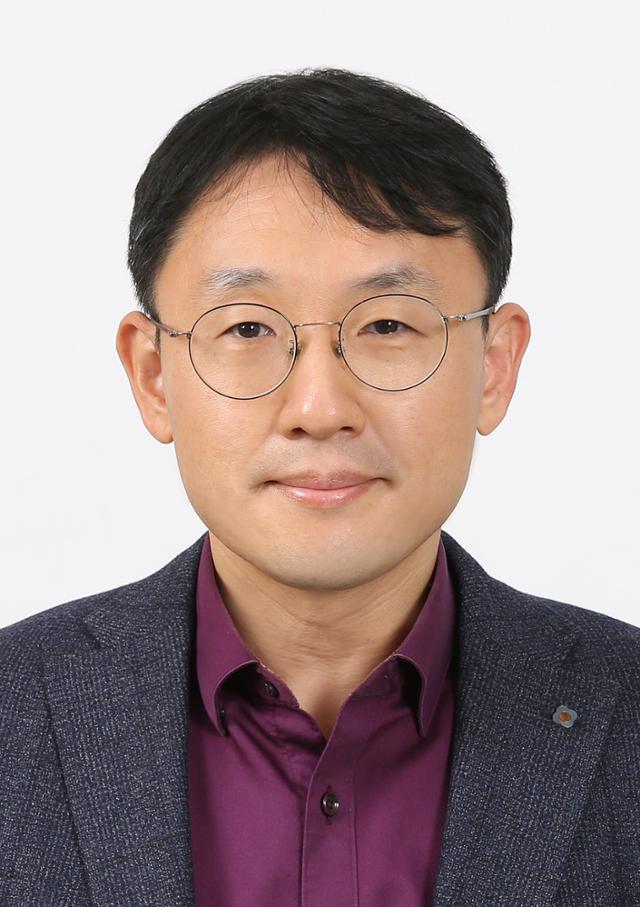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