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에게나 삶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명 문화계 인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남긴 작품 또는 예술인을 소개합니다.
1967년 그러니까 열 아홉 살 때였어. 미국에서 공부하며 밴드 비틀스 노래에 꽂혀 있었지. 비틀스의 8집 ‘서전트 페퍼스 론리 허츠 클럽 밴드’가 나와 LP를 샀는데 충격이었어. 수록곡 ‘위드인 유 위드아웃 유’에서 “삐용삐용”하는, 생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싶더라고.
비틀스 기타리스트였던 고 조지 해리슨이 작곡했는데, 알고 보니 시타르라는 인도의 전통 현악기로 낸 소리라는 거야. 인도 철학에 빠진 해리슨이 인도에 가 연주자인 라비 샹카르(1920~2012)에게 배우고 온 거지.
처음엔 기괴했는데, 들을수록 소리에 끌렸어. “삐용삐용”하는 소리가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할까. 시타르 연주할 때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 당시 유행하던 히피 문화와 여러모로 궁합이 잘 맞았지. 영혼을 달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게 비슷했고. 음식으로 비유하면 홍어회 같았어. 왜 있잖아,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뭐야’ 싶어 못 먹겠다가도 그 삭힌 풍미에 묘하게 빠져들어 계속 찾는 것처럼 말이야.
비틀스 앨범으로 시타르가 영ㆍ미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나 같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샹카르란 음악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 샹카르가 미국으로 건너 와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돼 공연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미국 서부의 몬터레이에서도 공연했고. 당시 라이브 실황이 담긴 ‘앳 더 몬터레이 인터내셔널 팝 페스티벌’(1967) LP 를 사서 들었는데 기가 막혔지. 명반이니, 한 번 들어봐. 샹카르가 서양에서 대가가 된 최초의 동양 뮤지션이 아닐까 싶어. 아직 그 LP 갖고 있냐고? 에이 지금은 없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거처를 옮길 때 지인에 팔았거든. 이삿짐이 너무 많아 그간 모아뒀던 LP 2,000여 장을 매물로 내놨는데 한 시간에 다 동이 났던 것 같아. 명반이 많았으니까, 하하하.

샹카르의 공연도 봤어. 20년 전 뉴욕 카네기홀에서였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 두 시간 공연 하는데 악기 조율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기타 줄은 6개지만, 시타르 줄은 10개가 넘거든. 한 곡 연주할 때 마다 악기 조율을 하는데, 15분이나 걸렸어. 악기가 예민해 곡 연주할 때마다 손을 봐야 하는 모양이더라고. 공연 맥이 뚝뚝 끊겨 미치겠더구먼. 기대를 엄청하고 화폐(돈)를 많이 내고 갔는데 이게 무슨 공연이야란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카네기홀 공연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지만, 시타르를 써 나도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 시타르 소리를 한국 음악팬에게도 들려주고 싶었거든. 1968년 한국으로 돌아와 1집 ‘멀고 먼 길’을 내고 시타르 연주곡을 만들려고 하니 장애물이 많았어. 우선 악기를 구하기 어려웠지. 기타 연주할 때 손가락에 끼는 (원형 모형의) 슬라이드바도 얻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길은 우연히 열렸어. 서울 신촌의 한 술집에서 비 오는 날 친구와 막걸리를 마시는데, 문득 쇠 젓가락이 눈에 들어 오는 거야. ‘아, 이거(젓가락)면 슬라이드 주법으로 시타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지. 왼손에 슬라이드를 끼고 기타 줄을 살짝 눌러준 뒤 연주하면 공명으로 “이잉~”하며 울림을 줘 독특한 소리를 내잖아. 혹시나 해서 집에서 젓가락을 슬라이드바 삼아 기타 연주를 해보니 시타르 비슷한 소리가 나더라고. 완전 신기했지. 그래서 만든 곡이 ‘여치의 죽음’이야.
이 노래는 1975년 낸 2집 ‘고무신’에 실렸어. 여치가 팔딱 팔짝 뛰다 죽는 것에 영감을 받아 만든 연주 곡이지. 친구 부모님이 하는 농장에 주말에 내려가 초가집에서 잤는데, 그 때 본 여치가 생각나서 만들었고.

‘여치의 죽음’이 실린 2집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어. 체제 전복적인 음악이란 낙인이 찍혀 모든 곡이 금지곡으로 묶였지. ‘여치의 죽음’에서 “삐용삐용”하는 소리가 권력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평도 있었고, 팔딱팔딱 뛰는 여치가 죽는 곡 구성이 정권이 몰락하는 순간을 표현한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더군. 군사정권 시절이라 자유에 목말라 있던 청춘이 예술에서 해방의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 군사정권의 최루탄 폭격에 죽어가는 청춘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곡을 만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여치의 죽음’에선 타악기 연주가 인상적이지 않아? 유명한 재즈 드러머인 유복성 씨가 연주했어. 인도풍의 음악이니 현지 전통 타악기인 타블라를 써야 했는데 못 구해 라틴 아메리카 전통 타악기인 봉고로 분위기를 냈어. 진품이 아닌 ‘짝퉁 인도 음악’을 했던 거지, 하하하.
2011년에 인도로 여행을 갔어. 시타르 소리가 그리워 악기를 샀지. 한국에 들고 와 막상 배우려니 너무 어렵지 뭐야. 연주 교습을 받는 데 줄도 많고 조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우다 말았어.
‘물 좀 주소’ 같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공연에서 ‘여치의 죽음’을 종종 연주했던 것 같아. 물론 시타르가 아닌 슬라이드바 끼고 기타로 비슷하게 소리를 냈지. 2015년 경주 한국대중음악발물관에서 한 공연에서도 ‘여치의 죽음’을 연주했는데 관객 반응이 무척 좋았어.
다시 ‘여치의 죽음’을 연주하고 싶어. 이젠 머리와 마음이 굳어 창작하기 쉽지 않지만 ‘여치의 죽음’처럼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자는 꿈을 꾸고 있어. 잇단 테러로 세상이 불안하잖아. 종교적인 이슈가 있지만 음악인으로서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혹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랄까. 고 존 레넌의 ‘이매진’ 같은 곡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하하.
샹카르 얘길 하다 보니 내 딸 양호가 생각나네. 네 살 때 같이 인도로 놀러 가 타지마할에서 비를 맞으며 춤을 췄는데 말이야. 양호는 기억을 못하겠지?
<가수 한대수의 구술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리=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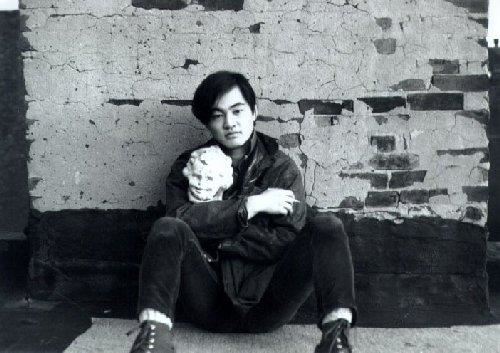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