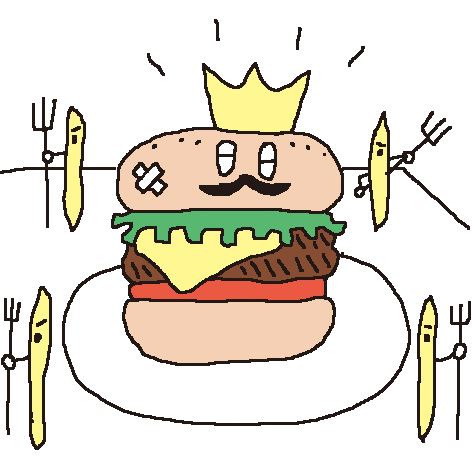
햄버거의 역사는 13세기 몽골계 유목민 타타르족에서 시작한다. 이들은 원정 가서 말고기를 먹기도 했는데, 그냥은 너무 딱딱해서 잘 다진 뒤 양파, 후추 등 양념을 해서 날로 먹었다고 한다. 이 조리법이 독일에 전해져 세월을 거치면서 빵 가루까지 넣어 굽는 ‘타타르 스테이크’로 발전했다. 18세기 이후에 함부르크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독일 이주자들이 끊이지 않아 ‘타타르 스테이크’는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미국에서는 함부르크식이라는 뜻을 담은 ‘햄버그 스테이크’로 알려졌다.
▦ 햄버그 스테이크를 동그란 빵 사이에 끼워 넣은 간편식 ‘햄버거’의 시작에 대해서는 설이 여럿이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서 이런 형태의 샌드위치를 처음 ‘햄버거’라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탄생 100여년 만에 종주국 미국의 연간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114조원)다. 1979년 첫 프랜차이즈 매장이 문을 연 한국은 2조원 안팎이다. 햄버거는 균형 잡힌 맛과 얼른 사서 먹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넓혔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건강의 적이라는 지탄도 적지 않았다.
▦ 우선 타깃은 패티다. 고기를 갈아 뭉쳐 만들다 보니 무슨 고기의 어떤 부위가 들어가는지 알기 어렵다. 1990년대 영국에서 광우병(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사태가 났을 때 이런 의심이 증폭되자 존 검머 농업장관은 4세 딸과 함께 BBC에 출연해 햄버거 먹는 쇼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패티의 위생 관리가 잘못돼 O-157 같은 병원성 대장균이 일으킬 수 있다. 이 병은 애초에 목축이 왕성한 아르헨티나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번져 가고 있다.
▦ 칼로리와 염분 과다, 영양 불균형 등은 시도 때도 없이 거론된다. 잠잠할 만하면 등장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썩지 않는 햄버거 동영상이다. 10년 지났는데 그대로라거나, 염산에 넣어도 녹지 않는다거나 여러 버전이 있다. 소비자로서는 화학첨가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발이 과장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시에 밀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버거 등을 내놓으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의 명성이 쉽게 저물 것 같지는 않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