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아름다움의 구원’(문학과지성사)이란 짧은 글에서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특징을 ‘촉각’, 더 정확히는 ‘촉각의 상실’이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디지털화된 모든 것은 매끈한 스크린에 투사하고, 그 투사된 이미지와 아이콘을 닿을 듯 말 듯 터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상. 애써 침 묻혀 종이 한 장을 가려 집어 들지 않아도, 훅 스치면 스르륵 페이지가 넘어가는 세상. 반질반질한 표면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져 내리는, 촉각 없는 세상. 이 세상은 결국 유동화된 세상, 뿌리 뽑힌 세상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그게 ‘쿨’하다고 믿는, 부동(浮動)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엔 아직 퇴화하기엔 이른 근육이 붙어 있고, 이 근육들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땀 흘려 움직이고, 쓰다듬고 만져야 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실제로 그러했을 때 쾌감도 느낍니다. 쿨한 걸 그리도 선망하는 건, 거꾸로 그만큼 우리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질척대기 때문일 겁니다.
캐나다 출신 기자 데이비드 색스가 미국과 유럽의 아날로그 문화 부흥 현장을 취재, 기록한 ‘아날로그의 반격’(어크로스)은, 그렇기에 ‘버릴 수 없는 촉각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 화려한 뮤직비디오로 그토록 화제를 모았던 MTV의 종착점은 결국 전기 코드를 싹 다 뽑아버린 ‘언플러그드(Unplugged)’였으니까요.
한병철은 ‘촉각의 회복’을 ‘잃어버린 내면성의 회복’으로 연결 짓습니다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기자들의 관심사란 고상한 철학적 언명이 아니라 그저 ‘권력’ ‘돈’, 그리고 ‘화제성’입니다. 해서 색스가 주목하는 ‘부활하는 촉각’의 포인트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럭셔리 시장의 탄생’입니다.
CD보다 가격이 두 배나 비싼데도 그걸 ‘힙하다’며 사들이게 되는 LP판, 미끈한 종이 묶음에 불과한데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엄청 창의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몰스킨 수첩의 인기,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노동력이 만들어냈다는 디트로이트 시계 메이커 시놀라의 유행, 자유자재로 보정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뜻밖에 따뜻한 휴머니스트임을 자랑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로모 필름에 대한 관심, 취향에 따라 점점 더 잘게 나눠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독립잡지, ‘단순변심’ 클릭 따위에 휘둘리느니 차라리 지면 광고를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길 원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전략, 책 한 권 고르고 실패할 모험조차 할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큐레이션 동네책방의 유행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사업모델이라는 게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봐야 그건 아무런 물적 토대를 지니지 못한, 뜬구름 잡는 허상에 가깝다고 호통치는 5장 ‘인쇄물’, 6장 ‘오프라인 매장’ 부분은 자못 통쾌한 구석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혹시,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아날로그 세대의 푸념일까요. 색스는 부인합니다. 그 증거는 아날로그의 반격을 이끄는 이들이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아날로그 세대가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디지털 기기들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봤다면, 어릴 적부터 디지털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자라온 디지털 세대는 오히려 촉각을 잃어버린 디지털 기기들을 우려하는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디지털에 익숙해질수록 ‘좋아요’ ‘공유하기’ 클릭 따위가 실제 세계와는 무관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럭셔리가 될 뿐입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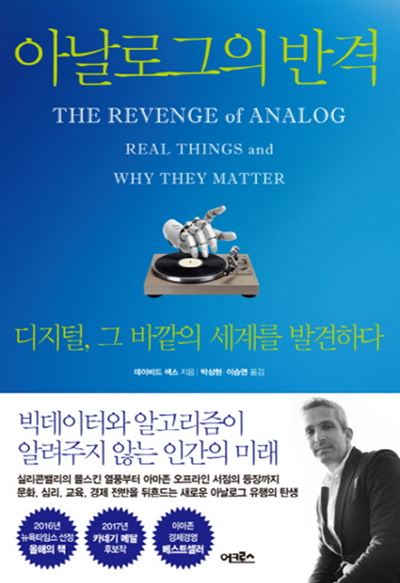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