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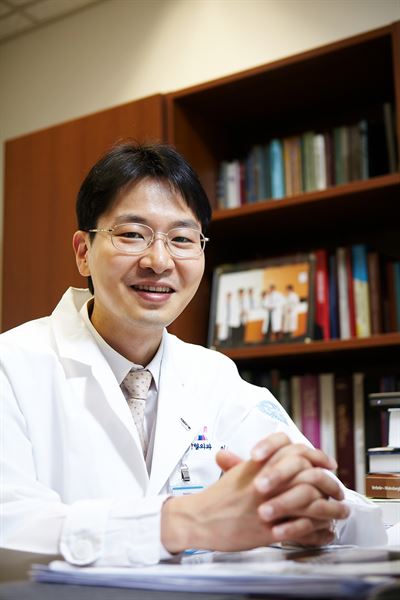
52세 남자 환자가 고열과 발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한달 전쯤 발바닥 아래쪽에 상처가 생겼지만, 통증이 크지 않은 탓에 혼자 소독하며 지냈다. 그런데, 4일전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상처를 통해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악취와 함께 발가락 끝이 새까맣게 변했다. 결국 환자는 괴사된 발가락을 절단한 뒤 며칠간 항생제 주사를 맞고 치유됐지만 신체 일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공포는 마음 깊숙이 남아 있다.
흔히 ‘당뇨족’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 병변’은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도 전신 상태가 안 좋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감각이 둔하다 보니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자발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거나 재발이 흔하다. 혈액순환이 부족한 발가락이 저절로 괴사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면 산소공급이 어려워 치유도 힘들다. 상처가 감염되면 며칠 만에 급격히 악화돼 다리를 절단하는 일도 많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고령화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합병증인 당뇨족이 환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뇨족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은 듯하다. 외국 논문들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발에 궤양이 발생한 경우 5년 후 사망률이 43~55%이었고, 절단하면 사망률이 74%에까지 이른다. 웬만한 암 못지 않은 높은 사망률이다. 상처 치료도 쉽지 않고,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복잡한 상태여서 의사 한 사람이 치료하기에 벅차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모여 ‘당뇨창상 협진 클리닉’을 9년째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의사가 한자리에서 환자 상처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결정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대면’ 협진 외래 진료다. 3명의 외과 의사가 매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지식과 생각을 나누면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고, 환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각각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진료임에도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뇨 창상 치료가 협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3명의 의사가 진료해도 1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수가만 인정받는다. 즉 협진하려면 병원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당뇨 창상 진단 분류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진료 항목의 중증도를 높이지도 못하는 당뇨 창상 진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암센터와 대조적이다.
당뇨병 환자의 발 상처를 진료 하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10년 201만9,000명에서 2015년 251만5,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 그 합병증인 당뇨족 환자도 늘 수 밖에 없다. 당뇨족 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