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단어의 용례는 다양하다. ‘노래 잘 하는 법’, ‘A교수의 교수법’, ‘세계를 보는 법’, ‘부모라면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법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법 없이도 산다’, ‘진리의 법’ 등등. 한편 법을 벗 삼아 살아가는 법관에게는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럼 법관이 수호해야 할 법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수호되는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안 되고,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 주권자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하위의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관이 수호해야 할 ‘법’은 헌법과 법률 등 대한민국 전체 법질서를 이루는 규범이고, 이를 ‘국법(國法)’이라고 한다.
X는 Y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 뒤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함께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Y는 약정한 날에 X에게 500만 원만 제시하며 수중에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하지만 X는 Y의 요청을 거절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사건을 맡은 판사는 Y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Y)는 원고(X)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603조가 “차주(借主)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당사자인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까지도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사람들은 불이익이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가 하면, 옳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도 한다. 내면의 동기야 어떻든 국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법은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법은 당해 법질서에 속해 있는 국민이나 권력기관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살아 있는 규범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누가 명하는가? 국법의 경우는 국가권력의 근원인 주권자가 명하게 되는데, 국민주권주의 정체에서는 국민이 명령자가 된다. 그럼 의무를 명하는 자는 주권자뿐일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
먼저, 이성(理性)이 내리는 명령에 따른 의무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성이 내리는 명령을 통상 ‘자연법’이라고 부르고, 칸트는 ‘보편적 도덕법칙’이라고 한다. 칸트가 주장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과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에 따른 ‘박애정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에 위기청소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봉사와 체험 여행을 다녀왔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하루 한 끼 제공되는 무료급식으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였는데, 봉사 중에 억누르고 억눌러도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 앙코르와트 등 과거 번영의 흔적들인 불가사의한 유적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킬링 필드를 연출해낸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세들, 특히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연민에 빠져 버렸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하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 칸트라면 이것을 이성이 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 제정한 명령에 따른 의무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의 명령을 ‘신법(神法)’이라 부르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일흔 번 곱하기 일곱 번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살아있는 일체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성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를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따른다.
법이 죽었다며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법이 정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어야겠지만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무감 형성을 통한 실천으로 옮겨질 때 법으로 승화됨을 명심해야 한다. 국법이든 자연법이든 신법이든 ‘자신이 삶의 준칙으로 삼고 있는 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경지의 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발을 붙이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의 기초질서부터 지켜나가자. 법의 준수는 법의 생명이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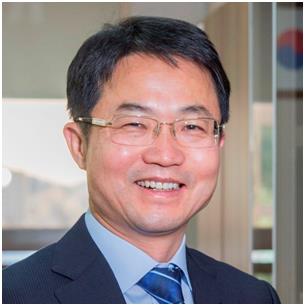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