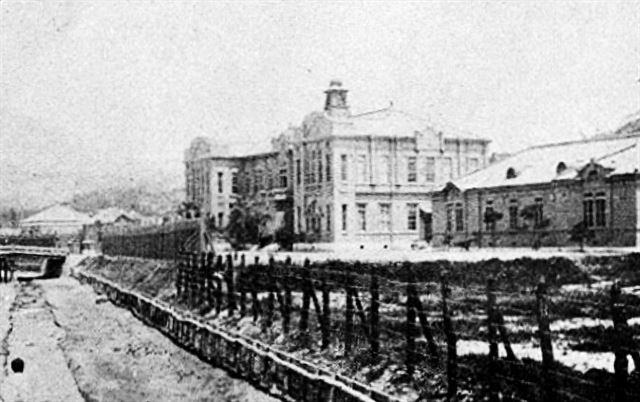

경성의 건축가들
김소연 지음
루아크 발행ㆍ276쪽ㆍ1만5,000원
일제시대 경성을 논하며 지금까지 종종 회자되는 ‘화신백화점’(1937)을 설계한 사람은 조선인 ‘최초’와 ‘유일’을 달고 다니는 건축가 박길룡이다. 조선인 최초로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건축기수가 돼 낮에는 총독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조선인이 의뢰한 주택과 사무소를 설계했다.
1932년 건축사무소를 최초로 개업한 조선인도 박길룡이었다. 그의 이름을 딴 박길룡건축사무소는 잘 나갔다. 건축주는 친일파 윤덕영(김덕현 주택이었다가, 후에 박노수 화백이 구입했고 현재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이 됐다)부터 간송 전형필(최초의 사립박물관 보화각, 1966년부터 간송미술관과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됐다)까지 극과 극이었다. 그의 몸은 친일이라는 환경에 있었고 마음은 조선인의 염원을 품었다. 총독부에서 일제의 지배와 수탈을 위한 건물을 설계했던 그는 개인 건축사무소 직원을 모두 조선인으로 뽑았고, 퇴근 후 그 사무소에는 총독부에서 임금 차별을 받던 조선인 건축가들이 모여 부업을 했다. 건축계몽 책과 건축신문을 펴냈다.

대학에서 철학과 건축공학을 전공한 저자 김소연이 쓴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건축가, 비주류 외국인 건축가 10여명의 삶을 통해 식민 교육, 식민 권력, 식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일제강점기 조선 건축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내면을 추적한다.
3ㆍ1운동에 연루돼 만주를 떠돌다 돌아와 고려대의 여러 건물을 남긴 박동진, 최고의 구조계산 전문가로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제국대 본관을 구조계산한 김세연,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며 문학에 눈 뜬 이상…. 조선인 건축가의 식민지 경험은 다른 보통 사람과 거리가 있었다. 당시 건축은 세태가 바뀌어도 배를 곯지 않는 직업이었다. 직장은 총독부였고, 일제의 지배와 수탈을 위한 건물을 짓는 일을 했던 그들은 부업으로 대부분 해방직후 반민특위에 회부된 사람들의 집을 설계했다. 한편으로 그 시대 건축가 중 3ㆍ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도, 항일운동을 하다 망명한 사람도 있었다. 관료, 경찰, 군인, 경제인, 언론인, 학자, 법조인, 심지어 예술가와 종교인도 친일 여부를 가리지만 건축은 예외였고, 이들의 과오는 잊혀진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과 과는 영원히 회색지대로 머무는 걸까. 저자는 오직 자신의 입신을 위해, 만주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입사해 최신 건축기술을 익힌 수재 이천승의 삶을 소개하며 이렇게 끝맺는다. “오늘날 박길룡, 김중업, 김수근만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시대상은 보여도 시대의식이 보이지 않는 삶은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