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정말 구매력 있는 상위 10%의 부자들에게만 최적화된 도시가 되어가는 듯. 그 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서울에서 계속 사는 건 너무 빡세고, (여행이 아니라) 가산을 정리해서 제주로 내려가기는 좀 겁나고 막차 타는 기분도 들 수 있다 싶을 때 약간 ‘간보기’ 기분으로 강원을 탐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약을 팔아왔는데 한국일보에서 이런 훌륭한 기사를….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문화이주민’이라 부르기로 하고 이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해서, 창업 지원도 하고 홍보ㆍ마케팅도 같이 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에 힘입어 올해는 더 열심히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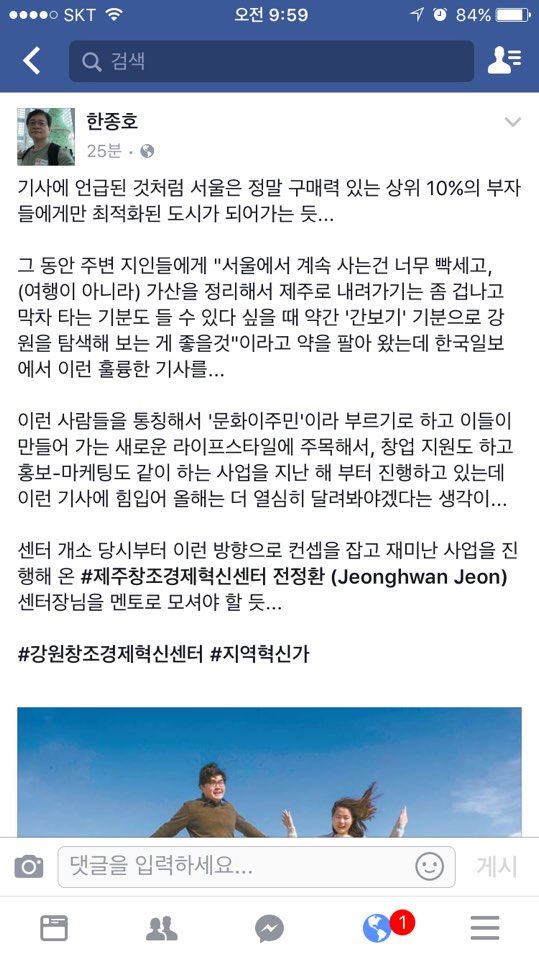
네이버파트너센터 센터장 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종호씨가 한국일보 3월 4일자‘서울은 싫어, 제주는 비싸… 나는 강원도로 간다’ 기사를 읽고 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소감입니다. 서울은 갈수록 돈 많은 이들에게나 살기 좋은 곳이 돼간다는 문제의식은 한국일보 기획취재부가 이 기사를 기획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획 기사의 시작은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사람들이 줄고, 대신 대안으로 강원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수소문해 강릉, 속초 등 동해안 도시에 주말주택 개념의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아예 이사를 간 이들을 찾아냈고, 왜 서울(혹은 수도권)을 떠났나 그리고 하필 왜 목적지가 동해안 도시인가 하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자 강릉, 고성, 속초를 찾았습니다. 30대 부부 두 커플, 40대 부부, 60대 부부 등 네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 강원도로의 이주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 역시 사람은 자고로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을 떠나 사는 것은 세상살이의 중심에서 떠밀려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서울 생활이 주는 갑갑함에서 잠시 벗어나 보기 위해 ‘바다 보러 가자’며 동해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바다 보러 가볼까’ 정도의 소박한 그 느낌이 켜켜이 쌓여 아예 강원도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을 떠나 강원으로 향하는 이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는데요. 대단한 돈벌이, 성공, 명성 등 서울서 부지런히 살면 손아귀에 쥘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러나 실제로는 한없이 쫓아도 쉽사리 닿기 어려운 신기루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깜냥이 해낼 수 있는 것만 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살 때랑 비교하면 버는 것은 적습니다. 생필품 값이 싼 것도 아닙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겠죠. 그래도 마음은 풍성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강원도에 가면 늘 동해 바다, 설악산의 풍광을 곁에 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풍광은 보너스고 진짜는 서울 사람으로 살면서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여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산ㆍ바다라 해도 더 볼 수 있고 더 돋보일 수 있겠죠.
직장을 옮기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같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기사를 읽고 나서 남긴 “인구의 분산이란 건 이렇게 서서히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다. 정체불명의 혁신도시인지 뭔지에 억지로 공공기관 하나씩 갖다 처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처럼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중 하나인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해 바다를 곁에 두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동해안 도시는 개발의 후유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아파트, 호텔을 찾아 보기 힘들었던 동해안 도시에는 최근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20층 넘는 높은 아파트와 호텔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과는 어울리지 않은 대형 크레인이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건물들은 대부분 현지인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건축물이 눈에 띄게 된 데는 그 동안 개발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런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현지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는 등 개발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놓이고 서울과 동해안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그 혜택은 서울사람과 강원도사람 모두가 아닌 서울사람에게만 가지 않겠느냐는 걱정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에서 만난 두 자영업자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해 바다를 보고 설악산을 들르기 위해 동해안을 찾겠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동해안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이들의 수는 줄겠죠. 가까워지니 하루 만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서울의 큰 가게, 큰 병원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요.”
고즈넉하던 해안의 작은 도시들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발전’을 떠올릴 사람들도 있겠지만, 화려한 겉모습 만으로는 발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큰 공장도 회사도 하나 없이 아파트만 호텔만 짓는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서 살겠다고 할지는 장담할 수 없겠죠. 오래된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말고는 달라질게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높아진 눈 높이를 채워주지 못하고 상실감만 더 커질지 모릅니다.” 강릉에서 만난 한 취재원이 전한 걱정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나도 진작부터 강원도에 살고 싶었는데. 그 용기가 부럽네” “강원도가 그리 좋아. 빨리 강원도에 집 얻어야겠네” 등 갖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이 기사가 공유되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눌리는 그 놀라운 횟수를 보면서 강원도행을 꿈꾸는 이들, 서울생활에 지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요?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 취재를 통해 강원도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