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中시안 1만2000㎞
도보여행 붐 일으킨 75세 남성이
여행서 만난 47세 여성 충동질에
남은 실크로드 구간 함께 완보
“왜 떠나지 않는가?
영원한 휴식이 다가오는데…”

나는 걷는다 끝
베르나르 올리비에, 베네딕트 플라테 지음
이재형 옮김ㆍ효형출판 발행ㆍ312쪽ㆍ1만3,000원
2013년 일흔 다섯의 할아버지가 다시 길을 나섰다. 프랑스 리옹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3,000㎞에 이르는 길을 2013, 2014년 두 해에 걸쳐 걸었다. 노인의 이름은 베르나르 올리비에. 2003년 3권짜리 ‘나는 걷는다’를 내놔 도보여행 붐을 불러일으켰고 국내에도 올레길, 둘레길 등 각종 길들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프랑스의 전직 기자다.
2013년 여행엔 동행이 붙었다. 베네딕트 플라테.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나 28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인연을 맺은 이 연극인은 ‘종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이다. 올리비에를 충동질해서 길을 나서게 한 이가 플라테였다. “처음으로 센 강변을 걸었을 때 우리가 정확히 같은 보폭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신의 손을 살그머니 잡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당신이야 말로 내가 기다리던 남자라는 걸 알았죠.” 플라테의 고백이다.
끼리끼리 만났다. 플라테는 강인한 여성이다. 커피와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종업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하트가 그려진 카푸치노를 플라테 앞에다 가져다 놓는다. 정작 플라테는 커피를 집어 들었다. 미식가임에도 거친 식사를 받아들였고, 샤워나 기름 낀 손 때에 대해서도 별 말 없었다. 가끔 딸로 오해를 받아도 “유머감각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 도보여행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여자가 더 힘들어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지만, 볼 일을 볼 때 남자보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곳”을 더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 외엔 딱히, 더 힘든 점은 없다.

올리비에라고 해서 차디찬 겨울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북극곰 대회 같은 데 참석하는 ‘노익장 과시 할아버지’가 아니다. “심혈관계 질병과 신장결석, 전립선 질환 초기 증상, 나날이 감퇴하는 기억력, 그리고 평발”에 시달리기도 하며 얼마 전에는 “경동맥에 협착증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그저 그런 할아버지다. 아무리 플라테의 충동질이 있었다 해도, 그 나이에 그런 조건이면 걷는 도중 중간에 잠시 앉아 쉬다 제 풀에 스르륵 잠들 듯 죽어도 별 이상이 없을 상황이다. 스스로도 “떠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올리비에의 핑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이 염소자리라는 것. 그냥, 쭉, 막,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습성을 점지 받았다. 우리말로 하자면 역마살이다. 다른 하나는 이거다. “왜 떠나는가?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왜 안 떠나는가?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댄단 말인가?”
전작 ‘나는 걷는다’ 세 권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4년 동안 실크로드 1만2,000㎞를 걸어서 2002년 중국 시안에 마침내 도착한 기록이다. 이 책은 올리비에에게 ‘세계 최초 실크로드 도보답사기’라는 명예를 안겼다. 이 세 권을 번역해서 내놓은 효형출판사 관계자는 “도보여행에 관심 있는 이들의 꾸준한 호응으로 지금까지 7만부 이상 나갔고, 지금도 주문이 들어오는 스테디셀러 중의 스테디셀러”라고 말했다.

‘나는 걷는다 끝’은 실크로드의 완성, 즉 프랑스 리옹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구간을 추가함으로써 동서양의 양 끝, 1만5,000㎞ 구간 완주를 마침내 완성시킨 기록이다. 그래서 책 제목에 ‘끝’ 딱 한 단어가 더 붙었다.
출발지를 리옹으로 정한 것은, 그래 실크로드니까 그렇다. 19세기 견직물 시장의 본고장이 리옹이었다. 리옹에서 나폴레옹의 진격로를 따라 이탈리아 북부를 횡단한 뒤 슬로베니아로 진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상 유럽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이 8,000명의 무슬림을 학살한, 그래서 나치 이후 첫 인종청소에 대한 전범재판을 열게 만든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일어난 지역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죽기도” 했던, “유럽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유럽의 규칙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위험한 열정의 땅” 말이다. 구체적 내용은 읽어보길.

이 지역에 대한 올리비에의 감정은 양가적이다. 오랜 정교 문화 덕에 금과 은으로 요란하게 치장한 교회는 호화찬란하다. 그 앞에서 신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성호를 계속해서 그린다. 올리비에는 신자들이 믿는 건 “금과 성호” 같다고 이죽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덕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색다른 화음을 이루어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다성음악을 노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도 하다.
올리비에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풍부하게 담아내면서도, 허세를 떨어대거나 무슨 도인이라도 된 양 내면의 깊이에 몰입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걸었노라, 보았노라, 썼노라, 그 뿐이다. 이런 가볍고 쿨한 발걸음이라니.
그래서인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소한 것들의 즐거움과 고마움이다. 프랑스의 도보여행자라 하니 주머니에 금덩이라도 넣어 다니는 것처럼 염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몇 십㎞씩 걷는 바람에 온 몸이 너덜해진 이들에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도 손짓 발짓 섞어가며 물이나 커피 한 잔이라도 내주고, 한 번 웃어주는 것 자체가 고맙다. 1만2,000㎞를 걸으면서 1만5,000명의 친구를 만들었다는 올리비에는 이번 여행에서 또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을까.
고령화 사회가 닥쳐오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웰다잉에 대한 얘기들이 풍성하다. ‘나는 걷는다 끝’, 이처럼 간결한 말이, 아니 행동이 또 있을까.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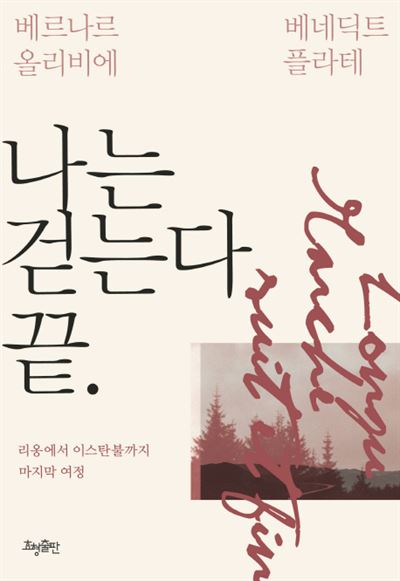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