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설을 쇠러 고향에 다녀왔다. 실향민께는 실례되는 말이지만, 내게 고향은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 이상의 의미는 없다. 툭툭 튀어나오는 사투리,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순대, 일말의 지역정서가 내 정체성에 새겨져 있지만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는 같은 향수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 사이 나뿐 아니라 고향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동네 가게는 물론이고 백화점 같은 큰 규모의 상권도 지역 브랜드가 차지했고 동네 사람들끼리도 다들 알고 지냈다. 지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빵집, 커피숍 등 거리가 프랜차이즈 일색이라 ‘작은 서울’ 같은 느낌이다. 고향 동네의 아무 집이나 불쑥 들어가 “형수! 나 왔소, 이번에 된장 잘 됐담서? 나 좀 퍼갈라네”던 우리 아빠의 서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고향의 핵심은 특정 장소나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 깃든 관계와 공동체성이다.
사실 나는 ‘차도녀’, ‘차도남’의 ‘차가운 도시’를 사랑해왔다. 옆집 숟가락 개수를 알 수 없는 도시의 적절한 무관심과 익명성 말이다. 하지만 이십 년 동안 10여 차례 이사를 다닌 유목민 생활에 소진되면서,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안위를 위해주는 공동체를 고민하게 됐다. 이웃끼리 택배도 받아주고 잠시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관계, 마을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해서 나누는 분위기, 나의 이웃이자 주변에 있는 그이네 가게를 기꺼이 이용하는 공동체. ‘아무래도 결혼과 아이는 괜찮습니다’며 손사래 치는 나를 짠하게 여기시는 부모님은 벌써부터 자기들 없으면 명절 때는 어쩌냐고 걱정하신다. 직계가족이나 정서적 고향 없이 늙어갈 우리 세대는 혈연과 씨족, 신상 털기와 간섭주의를 벗어나 의미로서의 고향, 즉 호혜적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4년 째 한 마을에 살자 챙겨보는 드라마가 생기듯 챙겨주는 이웃이 생기고, 비닐봉지가 아니라 장바구니와 반찬 통에 물건을 담아주는 단골이 생기고, 무엇보다 공동체경제네트워크가 생겼다. 요즘 나는 마을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대신 ‘모아’를 사용한다. 모아는 공동체 만들기에 공감한 가게들을 하나로 엮고, 그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대안화폐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5%를 덤으로 얻고, 공동체가게는 현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의 일부를 공동체기금으로 기부한다. 소비자는 선불화폐인 모아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와 미리 당겨쓰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공동체기금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 공동체가게는 마포에 위치한 식당, 서점, 재활용 가게 등 60여 곳으로 곧 망원시장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대안화폐만으로도 일상의 모든 소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모아를 통해 소비의 결과가 대기업의 수익과 신용카드 수수료로 빠지지 않고 지역으로, 주민들 사이로 흐른다. 이를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씨는 “관계가 곧 자본인 셈”이라 했고, 경제학자 깁슨 그레이엄은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라고 했다. 생활이 곧 소비인 세상에서 경제활동으로 얽힌 관계는 공동체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모아는 모바일 결제는 물론 은행에 예치된 주민들의 돈을 모아 공동체 내에서 유통하는 공동체은행, 공동의 자산을 늘리는 공유재 확대운동을 준비 중이다.
내가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바라는 설날 모습은 아주 소박하다. 쉐어하우스에 함께 사는 ‘식구’들과 작고 오래된 단골 가게에서 장을 봐 와서 만두도 빚고 전도 부치며 명절음식을 이웃과 나눠먹고 싶다. 독립적인 삶을 사랑하지만 큰 틀에서는 얼굴이 있는 관계로 이어진 공동체의 한 점이고 싶다. 이 서울에서 서로를 위한 경제로 얽힌, 지금과는 다른 의미의 ‘고향’을 만들 수 있을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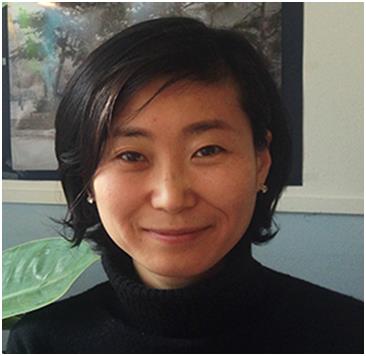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