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주 퇴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퇴임 직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박수갈채를 받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젊은 지도자라는 매력, 민주주의 대한 신뢰와 열정 등이 그것이겠지만 “두 걸음 전진해도 한 걸음 물러선다고 느끼는 것이 민주주의”(1월 12일, 고별 연설) “기자는 아첨꾼이 아닌 회의론자”(1월 18일 기자회견)처럼 설득력 있는 연설 능력과 간명한 메시지 전달 솜씨도 한몫을 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7일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살아남는 법: 책’이라는 기사는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사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후 버락 오바마처럼 책읽기와 글쓰기로 자신의 인생관과 신념, 세계관을 형성한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한다. 분초 단위로 짜여진 공적 생활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그는 매일 취침 전 한 시간씩 책을 읽으며 견뎌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서가에서 링컨, 루스벨트 같은 전임자들 전기는 물론이고 철학ㆍ역사책을 자주 찾았다. 무엇보다 문학작품을 즐겨 읽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출발해 인종문제를 다룬 VS 나이폴 같은 제3세계 작가, 남미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브리엘 마르케스, 뿌리 잃은 이민자 문제에 천착하는 줌파 라히리까지 폭도 다양하다. 문학의 본령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라면, 오바마 전 대통령 연설이 주는 감동의 원천은 기교나 수사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 쌓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물 아닐까.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독서)은 음악 감상이나 TV 시청이나 명작영화를 보는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며 “세계화ㆍ기술발전ㆍ이민 등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인류가 하나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라는 인터뷰에서는 범상치 않은 지성인의 풍모가 느껴진다.
우리나라에도 오바마 못지 않은 독서광 대통령들이 있었다. 6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철학ㆍ종교ㆍ문학 서적 소개로 가득한 ‘옥중서신’에서 알 수 있듯 “독서광이 아니라 독서왕”(최진 ‘대통령의 독서법’)수준이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 역시 옥에 갇혔던 젊은 시절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책들로 감옥 안에 사설도서관을 만들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2012년 출간된 ‘박근혜의 서재’(박지영 지음)에 따르면 새무얼 스마일스 ‘자조론’, 마거릿 대처 ‘국가경영’같은 책들을 탐독했다고 한다. 독서가였다는 주장이다. 상반되는 증언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전여옥씨는 에세이에서 박 대통령이 인문학적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신문기사조차도 깊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통치언어를 분석한 근간 ‘박근혜의 말’(최종희 지음)에 따르면 1974~2012년 약 40년간 박 대통령의 일기를 정리한 ‘박근혜 일기’(박근혜 연구회 편저)에 박 대통령이 무언가를 읽었다는 언급은 어머니가 썼다는 수필집을 포함해 단 4차례라고 한다. 반면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교육방송,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TV프로그램을 본 뒤 남긴 글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TV시청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언어능력이 대체로 독서량에 비례한다는 상식으로 판단해 본다면 “쓸데 없는 규제는 아주 우리의 원수”라거나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같이 듣는 이를 아연하게 하는 대통령의 말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느라 바쁜 현대 정치인에게 호학군주(好學君主)와 같은 고전적 지도자의 덕목을 들이밀며 다독(多讀)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미국에는 “마지막 독서를 언제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로널드 레이건처럼 이미지와 연기력 만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지만 이제 우리는 책을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는 희망의 표현이다.
이왕구 국제부 차장 fab4@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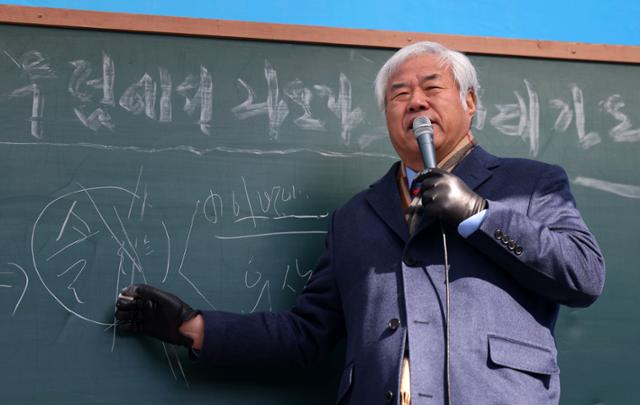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