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신당하시기 전에’라는 말은 나를 극도의 흥분상태로 몰아넣었다. ‘당신이라고 털면 먼지가 안 나오겠어’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너희들 완장 찼나? 어느 놈이 시켰어? 이명박이야 최시중이야?’나는 잠시 이성을 잃고 속사포로 쏘아붙였다.”
한국일보 주필을 지낸 노진환(70) 전 서울신문 사장이 털어놓은 2008년 3월 6일의 기억이다. 이명박정부가 갓 출범했을 무렵 받았던 문화부 제2차관의 전화였다. 아는 후배였던 차관을 내세워 접근한 이명박정부나,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차관 모두에게 격분했다. 이를 거부하자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가 이어졌다. 당시 수사한 금융조세2부의 부장검사가 우병우였다. “소년등과해서 곰삭은 맛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게 검찰 주변의 우병우에 대한 평가였다 한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풍부하게 담긴 노 전 사장의 회고록이다. 정치부 기자,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했던 기자여서 흥미로운 일화도 많다.
가령 김일성은 1994년 죽기 직전 북한을 드나들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내가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했다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시 밖에 나갔던 부속실 직원이 쏜살같이 되돌아와 김 회장을 밖으로 내보낸 뒤 “수령님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라고 책망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한다. 김일성이 70세가 되던 1982년쯤 전권을 아들 김정일에게 물려준 뒤 사실상 유폐됐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이런 김정일을 견제하기 위한 김일성의 승부수가 아니었겠냐는 추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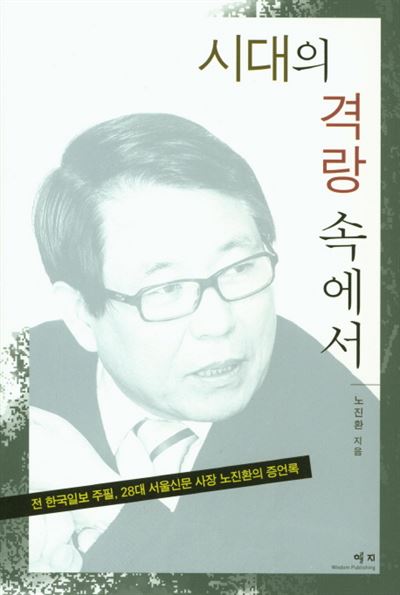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한꺼번에 북한에 보낸 뒷얘기도 있다. 북한 처지에서는 ‘의리’를 지킨 이들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상급 대우, 우리로 치면 차관급 대우를 했다. 경제난이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에 63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이런 대접을 하려니 버거웠다. 이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남한에 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했다. 물론 남한은 거부했다.
보람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관 200명을 증원했던 일을 꼽았다. 부존 자원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은 외교여야 하고, 때문에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 수준의 “초실세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게 노 전 사장의 소신이다. 김대중 정권이 각 부처에 있던 통상 기능을 한데 모아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바꾼 것은 이런 차원의 발상이었다. 여세를 몰아 노무현 정권 때 송민순 외교부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외교관 200명 증원’이라는 일을 해냈다고 노 전 사장은 밝혔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