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생각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나
로베르트 미지크 지음ㆍ오공훈 옮김
그러나 발행ㆍ172쪽ㆍ1만2,000원
지배층이 언론을 매수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의 출처는 마르크스다. 그래서 “모두가 마르크스주의자다. 어느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은 그다지 틀리지 않다.
오스트리아 언론인 로베르트 미지크(50)는 ‘좌파의 생각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나’에서 마르크스로 시작해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좌파 사상가들이 어떤 상식을 만들어내왔는지 추적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그람시의 ‘시민사회’ ‘헤게모니’, 아도르노의 ‘비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푸코의 ‘담론’이 이런 상식이 된 개념들이다. 낡았다고들 하지만 후기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저자에 따르면 좌파 사상가들이 인간의 자아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마르크스가 “인간의 소외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이후부터다. 인간이 속박과 억압에 짓눌려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롭다고 한 사르트르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저자가 상식이 된 좌파 사상을 되돌아본 이유는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길 잃은 좌파들을 향해 연대를 주문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일 자본주의가 안정된다면 ‘소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비판해야 할까? 억압 받는 사람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권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설사 이런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비판(Kritik)’과 어원이 같은 ‘위기(Krise)’는 회복되기 직전 병세가 마지막으로 격심해지는 순간을 뜻한다. 말하자면 비판은 희망으로 향하는 출입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탈리아 출신 공산주의자 로산나 로산다는 자서전에서 “‘너희는 확신을 품고 살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군’이라고 생각했다”고 썼다. 저자는 좌파 사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항상 불분명하며, 이제까지 분석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갈라지고 찢겨진 현대의 다종다양한 좌파들이야말로 좌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그들의 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변해림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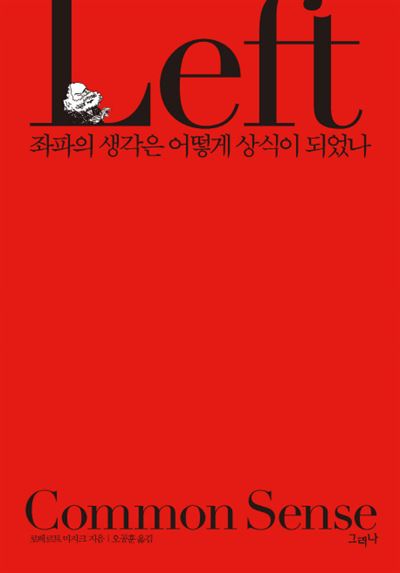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