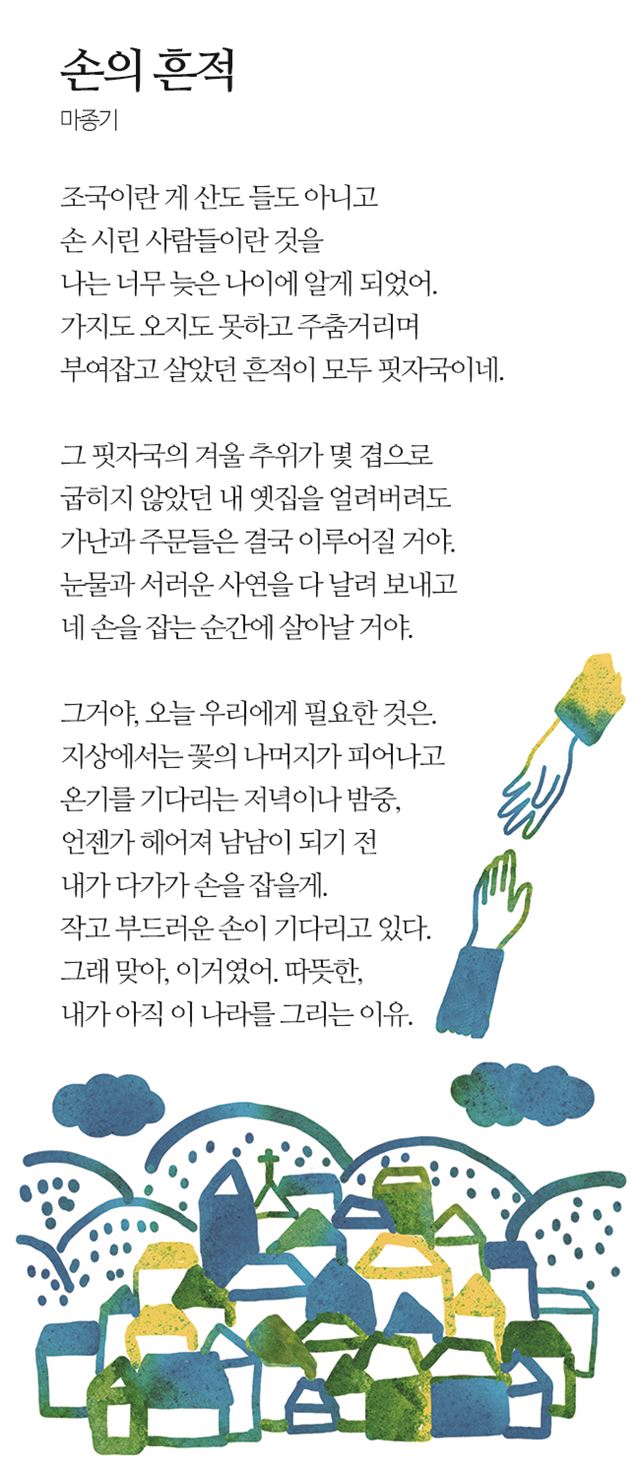
마종기 시인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떠나, 오랜 시간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모국어로 시를 써왔습니다. 그의 시에 조국, 나라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기원인 조국을 호명하고, 그곳을 잡고 존재 확인을 하고, 다시 일어섰겠지요.
나라 밖으로 떠나지 않았는데, 이곳에 살면서 조국, 우리나라를 묻게 되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이 시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조국이란 게 산도 들도 아니고 손 시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시린 손을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싶은 것. 그 손을 잡는 순간에 살아난다면, 역설적이게도 시린 손이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너와 나를 우리의 범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까지 그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 전체가 우리입니다. 함께 김장을 하고 함께 상을 치릅니다. 조국,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속은 한통속, 마땅히 우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잡았을 때 그래 맞아, 이거였어. 따뜻한. 나라는 그 최소한의 손을 내밀 의무가 있습니다. 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작고 부드러운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겠지요.
이원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