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들어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등장한다. 특히 기업 관련 수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빠지는 법이 없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한진그룹 관련 내사를 종결한 뒤 자신의 처남 강모씨 명의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아들 회사를 통해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ㆍ공급 등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 일감 몰아주기는 이처럼 사익 편취의 방편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대 그룹 중 2015년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 수는 전체(926곳)의 28.2%인 261개사였다. 주요 그룹은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 되는 계열사를 20~30개씩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이 많은 정보통신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 본체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 일감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해 대물림하는 통로로도 활용된다. 흔히 재벌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운 뒤 상장시켜 상속자금을 마련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일종의 ‘자기복제’ 방식이다. 이것만 제대로 틀어막아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래서 규제는 풀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문제적 행태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그런데도 관련법은 허술하다.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제조항이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지분율을 0.01% 낮춰 제재를 피한 기업도 있고,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이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2월 시행 이후 제재 건수도 현대그룹 한 건뿐이다.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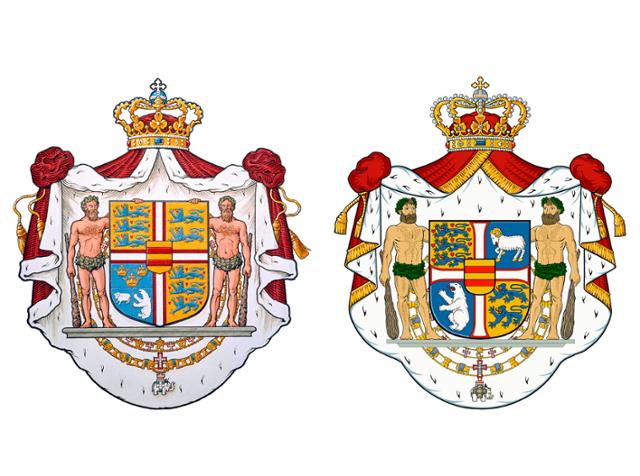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