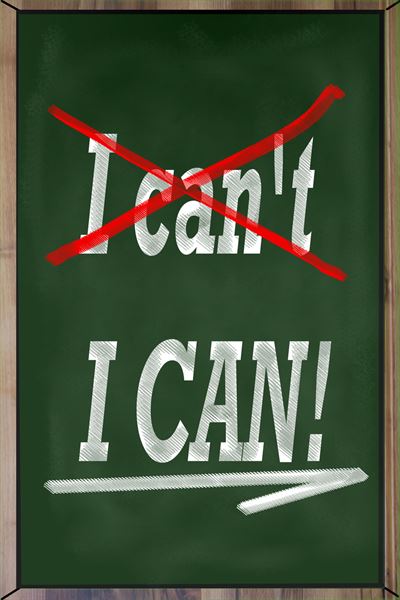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휴(심호흡), 할 수 있다.”
9대 13의 절대열세. 심박수 절정의 긴장된 순간. 응원하던 사람마저 다 포기한 절체절명 위기. 그럼에도 차분한 혼잣말로 의지를 다진 만 스무 살 청년(펜싱 박상영 선수)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영화로 만들었다면 현실성 없다고 분명 욕 먹었을 그 자기최면과 역전의 과정은 의지와 긍정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 준 사례다. ‘할 수 있다’ 신드롬이 뒤따랐다. 그 장면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겠다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다. 큰 울림을 준 그 감동의 한마디가 이용 혹은 악용되는 상황이 올까 하는 점이다. 사회 구성원의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만 강조했던 개발시대의 그 ‘정신력 만능주의’가 재림하는 최근 상황을 봐도 우려가 커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은 이 훌륭한 소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만나 박 선수의 역전 금메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감과 도전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뛴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절 경축사 핵심 메시지 역시 “우리 해 낼 수 있다”는 캔두이즘(Can-doism)이었다.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지고 있다”며 ‘헬조선’ 유행을 타박했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공동체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용기를 불어넣고 긍정론을 설파하는 것도 지도자의 훌륭한 덕목 중 하나다. 대등한 신체적ㆍ물질적 환경을 갖춘 개인 및 집단 간 경쟁에서 정신력은 꽤나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력이란 것도 성공과 승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만, 위력을 발휘한다. 정신력은 개인마다 다른 정도로 발현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국가대표급 정신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반면 시스템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면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공평하게 그에 의지해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는 법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자이돌격(萬?突?)과 가미카제(神風) 자살공격을 앞세우고도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미국에 참패한 것을 봐도 그렇다.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와 소외된 이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해도 될 만큼, 그들에게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나? 젊은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부모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지방정부가 관내 청년에게 품위를 유지하라며 월 50만원을(그것도 6개월만) 준다는 계획에, 중앙정부가 ‘도덕적 해이’라는 모욕적 언사까지 동원해 가로막는 게 바로 인프라의 현실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30%에 불과(통계청 사회조사)할 정도로 사회ㆍ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크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정신력을 말하면 공허하다. 인프라나 시스템 부재의 현실을 숨기고, 부조리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자식들이, 후배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체계를 갖춰 주는 것은 앞선 세대의 책무다. 다음 세대가 실체도 없는 정신력에 기대기보다, 잘 갖춰진 인프라와 시스템 혜택을 보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일 말이다. 인프라가 부족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 땐 안 그랬다, 근성 좀 가져라”는 조언을 늘어놓는다면, 소통은 거기서 끝이다.
이영창 경제부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