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렬하는 이 여름이 가고 나면 올해도 어김없이 수시와 함께 대학입시의 계절이 시작된다. ‘100세 시대’ ‘인생 3모작 시대’ 등이 진전됨에 따라, 전에 비해 대학입시가 인생 최대의 갈림길 노릇을 하는 비중이 줄어든 듯 보인다. 우리 대학이 졸업 후 첫째 직업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 전반을 지탱해주지 못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회이동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굳히기에 들어간 승자독식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대입은 여전히 지옥이다. ‘있는 사람’들이나 이 지옥을 피해 해외로 자녀를 내보낼 수 있을까, 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이 지옥과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기간을 대면해야 한다. 게다가 전국의 대학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입 관련 정책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대입 전형은 전문가조차 헤맬 정도로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주요 대학의 당락에 수리논술, 구술면접 등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렇다 보니 출제범위가 늘 이슈가 되곤 한다. 매년 반복되는, 교과과정 안이냐, 밖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 대표적 예다. 그 경계가 근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문과계열의 논술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의 경우도, 더 나은 인재를 뽑자는 대학과 필요 이상의 부담을 피하자는 수험생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한층 민감하게 전개되곤 한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수험생들은 결국 불안한 마음에 고비용의 사교육 시장에 의존케 된다. 대입 관련 사회적 비용이 웬만해선 줄어들지 않는 까닭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대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근본적, 구조적 차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제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같이,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출제된 문제가 교과과정 내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하는 건, 사실 무를 반 토막 내는 것처럼 단순하고 명료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무리 오랜 기간 여러 차원을 두루 포괄하며 중지를 모아도, 이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한층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처럼 중등교육과정부터 아예 교과서를 두지 않는 것이다. 모든 교과목에서 교과서를 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무모할 뿐이다. 수학, 과학 같은 기초과목이나 외국어 같은 도구 과목에선,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없는 교육은, 이를테면 문학과 역사, 철학, 사회과학 관련 교과목이나 음악, 미술 같은 예술 관련 교과목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과목은, 저들 교육선진국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입증해왔듯이, 고전 같은 양서(良書)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양서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양서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기에, 중등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육목표를 너끈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교과서 없는 교육은 대입 관련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란 차원서만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소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교육방면서 취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이 교과서 없는 교육이기에 그렇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둘러싼 문명조건의 변화로부터 중등교육과정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한창 펼쳐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 세계화는 이젠 당위나 목표가 아닌, 일상의 기본값(default)으로 작동되고 있다. 자동화와 사물인터넷ㆍ인공지능ㆍ증강현실ㆍ증강인간 등은 늦다고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언스 시대의 본격적 개막이다. 여기에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들로 중첩된 네트워크 사회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국의 시민이자 세계시민이란 정체성을 동시에 구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마저 부여받았다. 과연 교과서라는 형식으로 이런 문명사적 변이와 시대적 요청에 온전히 대응해갈 수 있을지, 지난 국정교과서 사태만 봐도 회의가 절로 든다. 교육선진국들이 왜 중등교육과정부터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동서고금의 좋은 책들의 집합’으로 교과서를 대신했는지, 그 까닭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교과서 없는 교육, 다시 말해 ‘양서 기반 교육’을 무조건 실시하자는 건 아니다. 교육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던 전철을 또 밟을 순 없다. 그렇다고 마냥 찬찬히 해갈 수만도 없다. 21세기 문명조건의 변이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그럼에도 “개, 돼지” 운운하는 게 우리 교육부의 민낯이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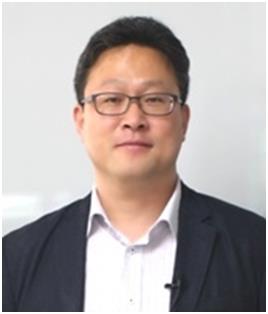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