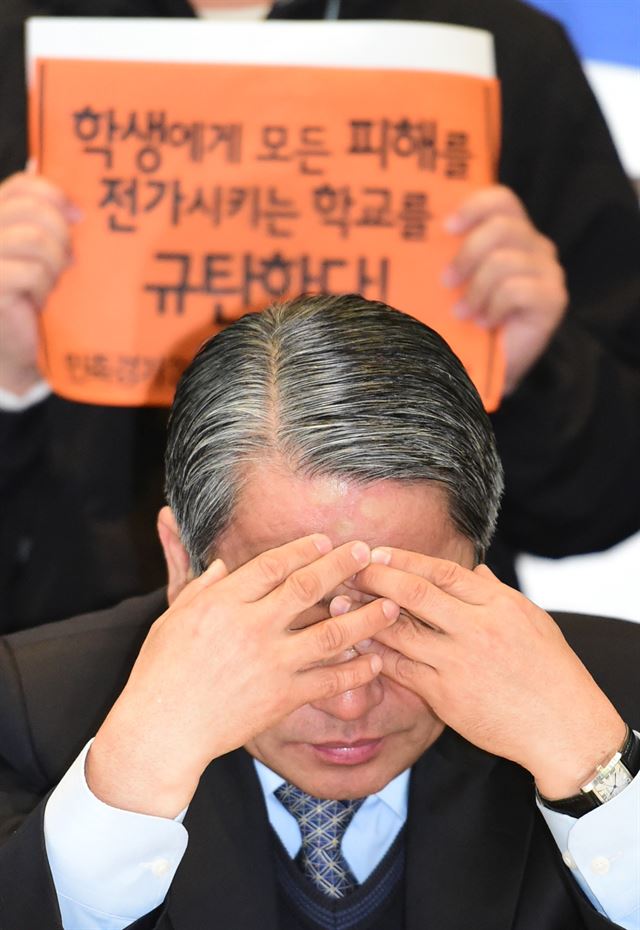
한 때 ‘대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위엄을 인정받았던 한국의 대학이 지금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대에서는 학생 ‘유치’를 넘어 ‘구걸’ 경쟁이 됐다는 한탄이 자욱하다. 학과ㆍ대학 통폐합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밖으로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공개수업’ 같은 것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한국 정치학 교수의 강의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까. 미국까지 안가더라도 국내 대학 강의가 이런 식으로 통합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학의 미래를 두고 대학교수들이 모여 2014년 한국대학학회를 만든 데 이어 28일 비판저널 ‘대학: 담론과 쟁점’을 창간했다. 학회장인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대학간 경쟁 심화, 선택과 집중 명분 아래 학과의 무차별 통폐합, 오직 시장성을 기준으로 한 업적 평가 등에 전문적 연구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면서 “미래 고등고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비판저널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학술지보다는 저널 형태를 띈 것에 대해서도 “학술지 등재 시스템, 논문 형식에 맞춘 규격적 글쓰기 같은 기존 대학이나 학계의 틀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학술지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개월에 한번씩 연 3회, 실물은 없는 전자책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창간호에서는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역과 대학의 선순환 균형발전’이 눈에 띈다. 장 교수는 문제의 핵심을 “1996년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정원을 자율화하고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해 대학을 팽창시켰던 스스로의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그 문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학생의 높은 학비 부담과 사학 중심 대학 체제는 손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단순히 취업률이 낮은 과를 폐지한다는 방식인 이런 작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청사진이 없다는 사실이다.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목표가 있으니 이리저리 조정하자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기계적 수치만 나열한 뒤 그냥 통폐합딱지를 붙여버린다. 이 때문에 학과, 대학 통폐합 작업에 교육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국가 지배’가 노골적이게 된다.
장 교수가 집중하는 바도 그럼 어떤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냐다. 일단 지역별 연구 중심 국공립대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기초학문을 지켜내는 쪽이다. 특히 지방 국공립대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어 조금 더 실용적인 융합형 개방공립대가 뒤를 받쳐야 하고, 그 뒤엔 각 지역ㆍ분야별로 전문화된 특수한 대학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 겹의 그물망을 만들 듯 고등교육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너무 큰 틀의 계획일 수 있다. 그러나 장 교수는 “학생 수 감소의 위기를 정부가 강조하고 대학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하는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제도 형성의 결정적 시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