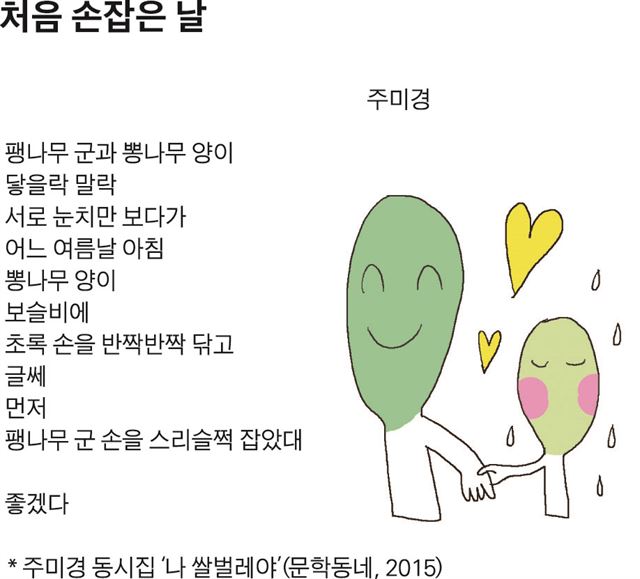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5.9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좀 실감이 안 난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여기저기서 결혼 안내장이 날아들어 예식장 다니기가 바빴다. 혼인 풍속도의 변화인지 모르겠으나, 주례 없는 결혼식도 있고, 신랑 아버지가 주례를 서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축가(?)를 불러주기도 한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맹세문을 읽는 결혼식도 있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한 영상물은 필수가 되었다. 신랑 신부의 키스 이벤트도 빠지지 않았는데, 거리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고 입맞추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마주치는 시절이긴 하지만, 신랑 신부는 대개 수줍어하면서 시늉만으로 키스를 했다. 넉살 좋은 애정 표현보다는 그런 모습에서 더 사랑과 신뢰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저 신랑 신부는 누가 먼저 신랑의 또는 신부의 “손을/스리슬쩍 잡았”을까?
주미경의 ‘처음 손잡은 날’은 짜릿한 시다. “닿을락 말락/서로 눈치만 보”던 팽나무 군과 뽕나무 양이 접속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뽕나무 양이 “보슬비에/초록 손을 반짝반짝 닦고” “글쎄/먼저” 손을 내밀었단다. 뽕나무 양이 먼저 용기를 냈기에 “글쎄/먼저”라 했겠지만, 팽나무 군이 먼저 손을 뻗쳤더라도 “글쎄/먼저”이지 않을까. 별행으로 떼어놓은 “좋겠다”라는 한마디는 화룡점정이다. 서로간에 끌리는 두 존재의 만남의 환희, 이를 바라보는 이의 선망과 질투, 축복의 다양한 감정들이 이 세 글자에 응축되었다. 나무의 여름 생장이라는 자연 현상이 빚어낸 장면에서 수줍은 사랑이 실현되는 찬연한 순간을 보았다.
이번 주말에도 가 봐야 할 결혼식이 있다. 신부가 중국 처녀라니 궁금증도 생긴다. 미국의 같은 대학에서 한국 총각과 중국 아가씨가 공부하다 만나 마음이 통했다 한다. 용기있게 삶과 사랑의 새 페이지를 여는 이 시대의 팽나무 군과 뽕나무 양 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김이구 문학평론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