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영국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어떤 국제 조약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한국 탈퇴를 가리키는 말은 ‘코렉시트’다. 그저 ‘코엑시트’가 아닌 까닭은 대다수 나라말에서 모음 충돌의 회피가 언어학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포스트 브렉시트’다.
이번 영국 국민투표의 주된 이슈는 이민자 문제 및 EU 멤버십의 득실 문제였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등이 아닌 잉글랜드, 런던 이외의 잉글랜드 나머지 지역, 노년 세대, 사회경제적 중하층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EU가 강요하는 긴축 정책을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진 2015년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그렉시트를 감행하지 못한 채 유로존 잔류와 긴축 요구안 수용을 선택했다. 그리스의 투표와 비교해 보면,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갖는 의미가 잘 드러난다. 두 나라 투표의 공통점은 EU가 상징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다수 대중이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불만이 투표 등의 제도적 정치 행위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영국 투표에서 이민자 문제가 부각된 것은 그동안 영국의 중하층 계층 구성원 다수가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정서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하층 인구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유럽 전반에 걸쳐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으로 나타나면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낳고 있다.
따지고 보면, EU가 이러한 이민자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영국의 경우, EU의 다른 나라, 예컨대 폴란드에서 온 이민 노동자들은 대개 젊고 영어도 비교적 잘하며 임금이 싼 3D 업종에서 일한다. EU와 상관없이, 영국의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은 외국으로부터의 값싼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핵심은 EU의 정치적 본질에 있다고 판단된다. EU는 유럽 지역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정치적 상부 구조다. EU는 유럽 지역에서 초국적 독점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직접 대변한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웠던 그리스 국민에게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긴축 정책을 강요했던 것이 그 적나라한 사례다. 이번 영국의 투표에서도 대다수 유권자는 ‘더 시티’라고 불리는 런던의 금융 중심가에 있는 초국적 금융 자본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투표라는 저항 행위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하층 영국민들이 지난 이삼십 년간 겪어 온 경제사회적 고통, 즉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소득 감소와 사회보장 축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 낸 것이고, 그런 한에서 EU는 분명히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점에서는 영국 다수 유권자의 판단이 정확하고 옳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런 고통이 EU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민 노동자 때문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틀렸고 올바르지도 않다.
일부 언론에는 상당수 영국 국민이 투표 결과를 이제 후회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브렉시트 찬성파들의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 보도는 부분적으로야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핵심을 건드리고 있지는 못하다. 문제는 EU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를 분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투표는 기본적으로 우익 포퓰리즘 세력의 정치적 선동이 먹혀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다수 유권자는 EU 가입 이전의 소위 ‘네이션-스테이트’로서의 영국이 보장해주었다고 기억되고 있는 바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헛된 정치적 노스탤지어에 갇힌 채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가장 치명적인 점은 영국 및 유럽의 좌파 진보 세력이 이런 사태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포스트 브렉시트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사회의 아랫부분만을 향해 고통의 펀치를 날리기 때문이다.
이재현 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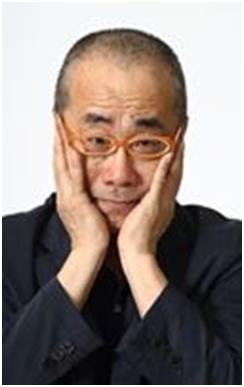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