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세에 독립출판사 차려
비영어권 무명작가 등단 통로
노벨상 수상작가 10명도
오언 출판사 통해 명성 얻어
영국에 ‘피터 오언 퍼블리셔스’라는 독립출판사가 있다. 까다롭게 책을 내고 일단 내면 웬만해선 절판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다. 실용서처럼 금방 팔릴 책들도 더러 냈지만 주력은 문학 번역이다.
1인 출판사로 시작해 65년을 버텨오는 동안, 헤르만 헤세 등 수많은 비영어권 ‘무명’ 작가들이 그 출판사를 통해 영미 문학시장에 소개돼 이름을 얻었다. 앙드레 지드, 타고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옥타피오 파스 등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만 10명. 거트루드 스타인, 에즈라 파운드, 헨리 밀러, 헨리 제임스, 마르퀴스 드 사드, 아나이스 닌, 나쓰메 소세키, 다자이 오사무, 미시마 유키오, 엔도 슈사쿠, 장 지오노, 콜레트, 장 콕도, 체사레 파베세, 블레즈 상드라스…. 마르크 샤갈과 살바도르 달리,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에디트 피아프의 자서전도 있고, 존 레논이 추천사를 쓴 오노 요코의 에세이도 있다. 이청준의 ‘서편제’와 이승우의 ‘생의 이면’을 출간한 것도 그 출판사다. 2000년 공유정 번역으로 낸 ‘The Reverse Side of Life 생의 이면’는 그 해 ‘페미나상’최종심에 올라 한국 신문들도 자랑스레 보도했지만, 출판사까지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1951년 단돈 875파운드로 출판사를 차려 저 일을 해낸 영국의 독립 출판인 피터 오언(peter Owen)이 5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피터 오언은 1927년 2월 25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가족공장을 운영하던 유대인 부모는 나치 기세가 심상치 않던 33년 6세의 그를 런던 북부에 살던 외가에 맡겼고, 얼마 뒤 그들도 영국으로 이주했다. 한 인터뷰에서 오언은 “교회 부설 학교여서 나는 매일 채플 수업을 들었다. 부모님은 유대교인이었지만 열성 신자는 아니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느끼느냐고? 별로! 독일서 태어났지만, 독일인이라는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영국인이라는 생각도 딱히 없었을 듯하다.
그는 다만 문학인이었고 출판인이었다. 돈도 이름도 없는 출판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 무명 작가의 좋은 작품을 남보다 더 열심히 찾아야 했겠지만, 문학에 국적이 뭔 대수냐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외삼촌이 런던 채링크로스의 꽤 이름난 서점(Zwemmer’s Bookshop) 지배인으로 일했고, 집에는 널린 게 책이었다. 그는 톨스토이의 번역서와 로렌스, 디킨스 등의 소설로 영어를 익혔다.
30,40년대 런던은 피난 온 지식인들로 붐볐고, 중소 출판업도 흥성했다. 아버지도 발 넓은 외삼촌의 도움으로 ‘비전 프레스 Vision Press’라는 작은 출판사를 함께 창업했다. 오언의 첫 직장도 한 영국인 출판사였고, 그는 사환이었다. 영국 공군(RAF)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직후인 48년 그도 네빌 암스트롱(Nevill Amstrong)이라는 이와 ‘피터 네빌’출판사를 차렸다. 전쟁 직후라 모든 물자가 귀하던 때였고 종이도 배급제였는데, 오언이 상무성(Board of Trade)의 한 직원에게 ‘말’을 잘해서 6톤 분량의 종이를 확보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들의 출판사는 사르트르의 책도 낼 정도였지만, 오언은 “쓰레기나 다름없는 책까지 내는 게 못마땅해(가디언, 16.6.1)” 3년 뒤 자신의 지분을 500파운드에 팔고 손을 턴다. 그 돈에다 어머니의 보증으로 은행서 대출받은 350파운드, 제대 보상금 25파운드를 보태 24세의 그가 창업한 게 ‘피터 오언 퍼블리셔스’였다.
헤세 ‘싯다르타’ 첫 영역
집요하게 작가를 설득해
저작권료 25파운드에 계약
히피 열풍 타고 60년대 불티
첫 책은 쥘리앵 그라크의 ‘ A Dark Stranger 어둠의 이방인’와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의 앤솔러지 ‘The Book in My Life 내 생애의 책’였다. 밀러의 책은 초보 출판인인 그에게는 가이드북이기도 해서, 그는 책에 수록된 작가들- 에즈라 파운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등-의 책들을 잇달아 계약했다. 훗날 그는 “밀러는 안목 있는 비평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밀러의 대표작들은 금서였다.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낸 건 54년이었다. 헤세는 46년 ‘유리알 유희’로 이미 노벨문학상을 탔지만 반독일 정서 탓인지 영미권에선 거의 무명 작가였고 영어 번역본은 단 한 편도 없던 상황이었다. 저작권 협상 당시 헤세 측에서 신생 출판사는 안 된다고 거절해 외삼촌의 ‘비전 프레스’를 경유해 기어코 계약했다는 일화가 있다. 저작권료로 그가 지불한 돈은 25파운드. 그는 전량 하드커버로 책을 제작했다. ‘싯다르타’가 영국과 미국 시장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한 건 60년대부터였다. 히피 열풍과 함께 동양 신비주의가 유행하면서 미국의 페이퍼백 출판사들이 앞다퉈 그를 찾아왔고, 미국 펭귄과 ‘팬(PAN)’을 두고 저울질하던 그는 거액(액수는 밝히지 않았다)의 로열티와 피터 오언 북스 리스트의 5, 6권을 끼워서 팬’에 넘겼다. 출판 잡지 ‘3:AM 매거진’인터뷰에서 그는 “두 출판사 모두 내가 요구한 로열티 액수에는 놀라지 않았지만, 펭귄과 달리 팬에는 우리 출판사를 잘 알던 빼어난 편집자가 두 명 있었다”고 말했다. ‘피터 오언’은 지금도 ‘데미안’ 등 7종의 헤세 책을 내고 있지만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개작을 해야겠다고 떼를 쓰다가 한참 늦게 출간하기도 했다.
헤세로 출판사가 자리를 잡기까지, 그는 책 제작서부터 포장 판매 배급 회계 등 모든 일을 혼자 해냈다. 직원을 뽑은 뒤로도 우편물은 직접 뜯었는데, 소인이 찍히지 않은 우표를 챙기는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있다. 그는 말년까지 작가의 인세 정산서만큼은 손가락 두 개로 직접 타이핑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성공하려면 적어도 5년은 ‘개처럼(like a canine)’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장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라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abctell.com) 르네상스 이후 여러 언어권의 문학 조류가 가장 격렬하게 뒤섞이고, 거대출판자본(저작권 에이전시 포함)의 시장 장악력이 아직 덜했던 시대의 덕도 물론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이슈’ 개척자
작품 속 아이러니ㆍ유머 중시
야설로 불린 사드의 책 등
전위적 작품 고집스레 출판
빼어난 감식안과 더불어 출판인으로서 그의 철학이 돋보인 건 50년대 말 이후 잇달아 낸 ‘전위’작가들의 책들 덕이었다. 자전적 성애 소설과 잣은 스캔들로 밀러보다 더 명성(?)이 높았던 연인 아나이스 닌(Anais Ninn)의 ‘Incest 근친상간’, 비트제너레이션의 시인 폴과 제인 보울스(Paul & Jane Bowles) 부부의 시집, 코카인 과다복용으로 숨진 안나 카반(Anna Kavan, 1901~1968)의 여러 작품 등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카반은 메이저 출판사 ‘조너던 케이프’에서 48년 책을 낸 뒤로 약물 중독 등으로 거의 잊힌 작가였다. 56년의 책 ‘A Scarcity of Love 사랑의 결핍’는 출판사를 못 구해 사실상 자비 출판을 했으나 인쇄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오언은 그 책을 재출간하고 이후의 작품과 카반 사후 미발표 원고까지 고집스레 출간했다. 그는 카반을 저평가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오언은 다른 출판사들이 내다버린 ‘잡동사니’들만 골라내는 출판인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의 컬트적 스타일은 다분히 모험적이었지만,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다. ‘3:AM’ 인터뷰에서 그는 “저급한 기준으로 작가를 고를 경우(…) 노골적인 준 포르노물이 되기 십상이다. 나는 작품 속에 아이러니와 유머가 있는지 따졌다”고 말했다. 그렇게 골라 출판한 책 중에는 ‘야설’로 통하던 사드의 책들과 아폴리네르의 ‘Les Onze Mille Verges 일만 일천 번이 채찍질’등도 있었다. 모두 첫 영어판 책이었다. 출판사는 부고에서 그가 “동성애자 인권과 여성, 마리화나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척자적인 출판인이었다”고 썼다. ‘The Connoisseur’s Handbook of Marijuana 감정가의 마리화나 안내서’(1973) 같은 책은 제목처럼 실용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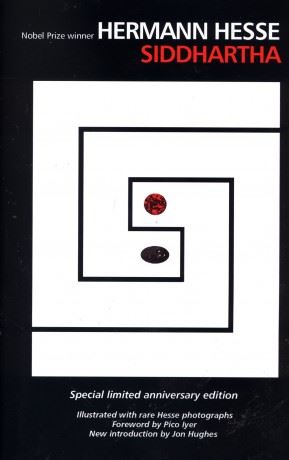
독일어도 능숙하지 않았던 그가 저 다양한 외국 문학 작품을 직접 읽고 선택했을 리는 없다. 그의 뒤엔 외삼촌을 통해 알게 된 미국의 출판사 겸 에이전시 ‘뉴 디렉션스’의 탁월한 출판인 제임스 로린(James Laughlin)이 있었고, 신뢰할 만한 번역가와 작가 친구들이 있었다. 헤세와 일본 작가들을 추천한 건 로린이었고, 사드와 장 콕도 등을 추천한 이는 걸출한 번역가이자 전기 작가 마거릿 크로스랜드(Margaret Crosland)였다. 훗날 크로스랜드는 “내가 평생 만나온 모든 출판인을 통틀어, 피터는 가장 일관적이고도 예측 가능하게 예측 불가능하고 짜증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늘 그에게 돌아가곤 했다”고 말했다. 작품을 두고 까다롭게 토론하고 따지고 심지어 번역료를 깎으려고 한 적도 많았지만, 늘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였다. 그에겐 또 좋은 편집자들이 있었다. 창업 초기부터 약 10년간 함께 일한 그의 첫 편집자는 ‘The prime of Miss Jean Brodie 진 브로디의 전성기’의 작가 뮤리엘 스파크(Muriel Spark)였다. 50년대 중반 로린이 사무엘 베케트와 다자이 오사무를 추천했는데, 오사무는 물론이고 베케트도 ‘고도를 기다리며’ 발표 전의 50대 무명 작가였다. 그는 오사무를, 스파크는 베케트를 골랐다. 스파크는 “둘 다 내자”고 제안했고, 그는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내 생애 최대의 실수였다”며 저 일화를 전했다. 스파크 역시 첫 책 2권을 ‘피터 오언’에서 냈고, 미시마 유키오 등 그의 대다수 작가들이 그랬듯이, 이름을 얻은 뒤 메이저 출판사로 옮겼다. 오언은 “뮤리엘은 내가 아는 가장 유쾌하고 유능한 편집자지만 유명해진 뒤로는 옛 친구들을 다 내다버리더라”고 농반진반 말했다(peterowenpublishers.com).
살바도르 달리가 그의 그림 같은 초현실주의풍 소설 ‘Hidden Faces 감춰진 얼굴’(1973)을 써뒀다는 정보를 그에게 알려준 건 그의 친구였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었다. 오언이 이태리까지 달리를 세 차례나 찾아간 이야기, 달리가 자기는 공증인의 아들이라며 대놓고 거금을 요구한 이야기, 삽화를 따로 그려주는 조건으로 그로선 부담스러운 선인세를 줬지만 그림이 “침대에 누워 낙서한 수준”이어서 초판에 넣었다가 빼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언은 “달리는 사기꾼의 전형(epitome of a conman)이었다, 재능은 있었지만!”이라고 말했다.
오노 요코의 ‘Grapefruit 포도(1964)’는 아포리즘과 삽화를 담은 책이다. 오노는 책 책 홍보를 요구하며 성가시게 전화를 해댔다고 한다. 한밤중에 전화로 “내게 프로모션 아이디어가 있는데…”라며 운을 떼는 오노에게 오언이 “보세요, 당신이 작곡은 잘하겠지만 출판은 내가 전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일 신경 쓰고, 나는 내 일하면 안 되겠소?”라고 쏘아붙여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존 레논이 서문을 쓴 재판을 낸 걸 보면 계약이 아예 깨진 건 아니었고 또 한쪽 얘기만 들을 일도 아니지만, 분명한 건 오언이 고집 세고 자신의 작가를 포함해 여러 사람과 불화했고, 자리 안 가리고 거친 말을 곧잘 하곤 했다는 거였다. 1994년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문학상을 타자, 함께 물망에 올랐던 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상을 못 탄 건 ‘스웨덴 아카데미의 스캔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성토하기도 했다. 드물게 그를 떠나지 않았던 작가 중 한 명인 슈사쿠는 2년 뒤 별세했지만, 슈사쿠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즈가 2007년 그의 작품 ‘Silence 침묵’의 판권을 그에게 사서 영화를 개봉한 일을 그는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선인세를 짜게 주고 번역료를 두고 끈질기게 협상하기로 악명 높았다. 대부분 많이 팔 기대 없이 책을 냈고 주된 고객은 어차피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80년대 대처 정부가 도서관 예산을 삭감하자, 업계 눈치 안 보고 혼자 책 값을 권당 1파운드 가량 대폭 인상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는 상대적으로 후했고, 자신의 월급은 아주 작았다고 한다. 그의 보수적 경영은, 좋게 보자면, 거인들과의 경쟁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기 위한 거였다.
그는 두 차례 결혼하고 이혼했고, 2녀 1남을 두었고, 2014년 대영제국훈장(OBE)을 탔다. 영미권 출판계는 독립출판인으로서 늘 어려운 형편에도, 시장 전망보다 작품성을 먼저 따지던 그의 고집을 기렸다. 최대 거래처였을 미국 뉴 디렉션스의 바브라 에플러(Barbara Epler) 회장은 “그는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위대한지 알았던, 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애도했고, 그에게서 책을 낸 적 없는 도리스 레싱은 “나는 오언과 그의 고독한 선택(lone stand)을 늘 존경해왔다. 그는 그가 아니었으면 아예 나오지 않았을 책들을 출판해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몇 안 되는 이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레싱이 말한 ‘고독한 선택’을, 가디언의 서평 담당자(John Self)는 2011년 기사에서 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녀린 희망(forlorn hope)’이라고 표현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