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권헌익 지음ㆍ박충환 등 옮김
산지니 발행ㆍ358쪽ㆍ2만5,000원
냉전은 존재했는가. 핵 공포로 인한 양 진영간 적대적 상호균형 말이다. 다들 고개를 끄덕일 테다. 세계사 수업 덕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문가 박명림(연세대)은 고개를 젓는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동아시아에서만 3개의 전쟁이 있었다.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척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비극과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는 ‘내전’이기도 하다.
냉전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건 미국과 소련 얘기일 뿐이다. 양 진영 중심부 국가의 냉전은 양 진영 주변부 국가의 피비린내 나는 열전을 깔고 앉아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우리가 참전하기도 했지만, ‘주변부의 열전’을 함께 앓았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저자는 ‘학살 그 이후’(아카이브)로 문화인류학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기어츠상을 받으면서 우리 독자들에게도 알려진 인류학자안 권헌익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래서 만대에 걸쳐 한국군의 죄악을 기억하리라는 증오비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지금은 휴양지로 이름을 얻고 있는 중부의 꽝남성 다낭 일대를 직접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기록했다. 이 책도 “현대세계의 전쟁과 집단기억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 지 보여줬다”는 극찬과 함께 가장 우수한 동남아연구서에 주어지는 미국의 ‘조지 카힌 상’을 받았다.
1989년 경제개혁정책 ‘도이머이’ 도입 이후 베트남에서 호황을 맞은 업종 중 하나는 관(棺)을 만드는 일이었다. 경제 부흥이 진행되면서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대규모로 택지가 개발되자 그 과정에서 각지에 버려지고 잊혀져 있던 유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유해 발굴 작업은 베트남을 유령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혁명전사였거나 신분이 확실하다면 국립묘지나 유족에게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개의 유해는 정체를 알기 어려웠다. 기억의 불일치도 있었다. 누군가는 혁명전사라 했지만, 누군가는 부역자라 했다. 특히 공산당이 ‘혁명의 토대’라 불렀던 비밀 요원들일수록 뒤에 남겨질 가족과 다른 조직원의 안위를 위해 신분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다. 베트남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프랑스, 미국 등 적국 군인도 많았다.
이 알 수 없이 뒤엉켜버린 채 나타난 죽음을, 그리하여 한꺼번에 등장한 유령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가 정통성을 우선시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앞세우는 베트남 공산당 정권을 비웃듯, 봉건 잔재나 미신 취급을 받던 전통 종교와 제사 의식이 전면적으로 부활했다.
무당들이 억울한 혼을 불러내 만나는 과정, 접신의 과정, 사당을 세우고 지전을 불태우면서 유령들을 편히 잠재우는 과정 등 저자의 상세한 취재 기록이 쭉 이어진다. 무당을 통해 죽은 원혼과 직접 대화해보기도 하고, 집요한 취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일부 지역민과 지방정부의 훼방을 뚫어가며 기록한 것들이다. 그 덕에 이제껏 소개된 저자의 책 가운데 가장 손쉽게 읽히기도 한다.
초점은 전쟁과 죽음이 찢어놓은 사회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다. 최초의 사회학자라는 뒤르켐의 제자 로버트 허츠의 ‘양 손’ 개념을 끌어 쓴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평가, 판정하는 손은 오른손이다. 꽉 쥐어진 주먹 형상이 어울릴 법한 오른손은 “권력의 균형, 국가간 연맹, 봉쇄와 도미노 이론, 혹은 핵무장 저지와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전 지구적 갈등을 논한다.” 왼손은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주로 갈라진 공동체와 이웃, 파열된 가족과 친족, 분열된 의식과 정체성에 관한 것”을 다룬다. 느슨하게 늘어져 자연스레 벌린 형태가 들어맞을 왼손은 이 죽음들을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손이다.
전쟁, 그것도 이데올로기까지 개입된 극한의 내전이 불러오는 양측간 격렬한 갈등과 충돌은 “교조적, 이데올로기적, 위계적 국가기관과 조직적 네트워크들의 팽창”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교조적, 비이데올로기적, 협력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들 또한 번성”하게 한다.

왼손이 들려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얘기는 사뭇 다르다. “십자포화가 난무하는 폭력적 양극 갈등의 거리에서 이미 그어져 있는 정치적 충성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잘 협력하는 사람들만이 신체적,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깍망’이라 불린 혁명조직은 혁명가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 여긴 인민들, “특히 인간적 연대의식을 회복하고팠던 여성들”이 깍망에 모여들었다.
깍망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가령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회사에 출근한 내 딸을 굳이 불러내서는 억지로 심부름을 시켜 멀리 내보냈다. 그 날 오후 베트콩이 딸의 직장을 급습,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생존을 위해 이뤄지는 이러한 교묘한 거래에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정보도 캐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살았으면 됐다. ‘아니 어떻게?’라고 묻는다는 건 서로를 곤란하게 할 뿐이다. 이 상황에서 애국자는 누구이며, 부역자는 누구인가. 또 그걸 애써 구분한다 한들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뒤얽힌 유해가 불러내는 기억, 뒤얽힌 유해가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화두는 ‘딱한 죽음’이다. 온갖 분석, 대책이 다 나온다. 오른손들의 경연장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 왼손의 역할은 무엇일까. 당연한 분노를 넘어 고민해볼 지점이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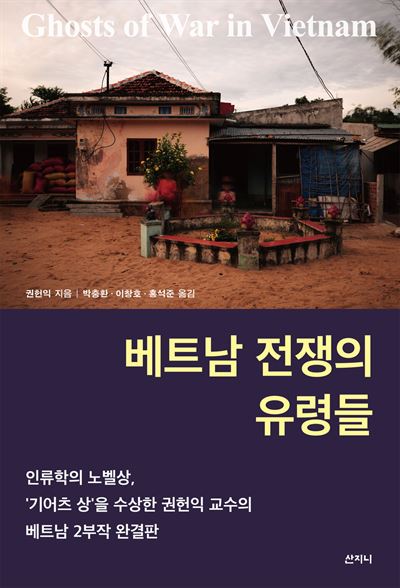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