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기만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올바르다. 우리가 ‘올바른’ 만큼,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처럼 보인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므로, 다른 사람을 ‘틀리게’ 만드는 나의 ‘올바름’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나의 올바름=나의 불행’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에 결론은 이리 이어진다. “다른 사람들의 악 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만, 불의의 원천을 이루는 차별과 정죄와 공격이 사라지고 원천적인 정의가 가능”해진다.
프랑스에서 ‘마르크스와 알튀세르의 유기적 전체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오래 강단에 섰던 이종영(59)씨가 신간 ‘마음과 세계-유배지에서 성스러움이 가능할까”(울력)에 써둔 대목이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내용보다 단호한 말투다. 이 단호함은 “사랑조차 때론 아름답지 않다”, “사랑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는 뼈아픈 자각에서 나왔다. 그 사랑의 밑바닥엔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긴다는 우쭐거림이 놓여 있어서다. 너를 안다고,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게 알고 보니 장악, 지배, 종속이었다는 고백이다. 진보라는 뜨거운 피를 지닌 이들에겐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다. SNS를 통해 저마다 옳음을 설파하는 목소리들이 여과없이 울리는 이 세계에서 매혹적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정신주의자로의 전환한 계기가 있나.
“사회 변혁 뒤가 궁금했다. 변혁하자는 이들도 그 뒤 얘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 2009년 신비주의자가 됐다. 신비주의라면 우리에겐 좀 이상한 개념이겠지만, 유럽에선 가톨릭에 포섭되지 않고 영성을 믿는 이들을 일컫는 일반적 개념이다. 자아의 선은 타자에겐 무시무시한 악일 수 있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쓰지 말자는 얘기다.”
-적극적 액션으로 사회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겐 변절로 읽힐 수 있다.
“신성함과 성스러움을 그래서 구분했다. 신성함이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뭔가 엄청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반면 성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낮은 존재,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신성함이 아니라 성스러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팠다. 사랑을, 존중을, 협업을, 협동을 하자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라. 그건 예외적인 성인들의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에 묻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끌어들이고 변화시킨다.”
-너무 정신적이어서 순진한 건 아닌가. 가령 요즘 우리 사회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하다.
“그 폭력성, 절망적인 폭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 남성은 얼마나 될까 되묻고 싶다.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가장 잘 보여준다 생각한다. 타인을 타인 그 자체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판단이 곧 공격이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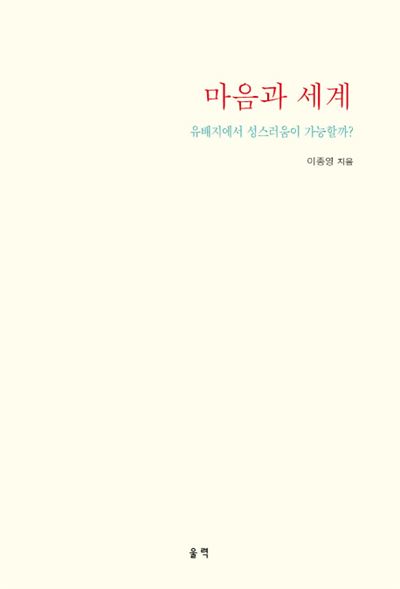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