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지음
창비 발행ㆍ276쪽ㆍ1만2,000원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여상한 이 말은 삶의 끔찍함을 완성하는 마침표다. 누군가의 삶이 끔찍해지는 동안 이런 여상함이 몇 번이고 있었을 것이고, 마침내 삶의 끔찍성이 증명됐을 때 여상한 말투로 이 말을 재차 읊어주면 삶은 비로소 완전히 끔찍해진다.
권여선 작가의 다섯 번째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에 실린 단편 ‘봄밤’은 삶의 끔직함에 포획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다. 남의 재혼식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영경과 수환은 이미 영혼이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스무 살부터 용접공으로 일한 수환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를 맞고 아내는 전 재산을 팔아 잠적했다. 노숙자 생활까지 경험한 그는 간신히 생계 유지나 하는 처지로 돌아오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단검처럼” 지니고 산다. 국어교사로 일하던 영경은 이혼 후 시부모가 돌을 앞둔 아들을 빼돌려 이민을 가버리면서 알코올중독에 빠진다. 술에 절어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 둔 영경이 친구 재혼식 피로연에서 만취했을 때 수환이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를 업는다.
그러나 12년의 동거 생활은 수환의 류머티즘이 악화돼 요양원으로 들어가면서 끝나고 영경도 중증 알코올중독으로 그를 따라 입원한다. 쉰이 넘은, 관절과 간이 각각 고장 난 커플이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렇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 삶의 값이 나오는 식이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값은 1보다 작고 그 역이면 1보다 크고.”
사회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해내지 못해 밀려난 이들은 서로에겐 적어도 1이 되고자 노력한다. 수환은 스스로의 분모가 너무 큰 게 미안해 “분자라도” 늘리고자 영경에게 외출을 허락하고, 영경이 모텔방에서 고주망태가 돼 있는 동안 허망하게 세상을 뜬다. 알코올성 치매로 금치산 상태가 된 영경은 수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가끔 그를 면회하러 오는 친언니는 영경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얘기하며 흘러간 유행가처럼 읊조린다.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이번 책에서 작가의 눈은 내내 나이든 이들에게 머문다. 늙었고 돈은 없는데 미각은 주책 맞도록 발달하니, 누추하지 않기가 힘든 인생들이다. 커지는 열등감에 비례해 말수도 한없이 늘어나지만, 세월을 버틴 대가로 얻은 눅진한 입담은 이들의 삶에 찰나의 윤기를 부여한다. ‘삼인행’에서 홍게 식당에 간 훈과 주란, 규는 옆 테이블 부부 중 누가 아이에게 홍게 대신 미역국을 먹였는지를 두고 대화한다. “에미”가 먹였다는 훈의 말에 주란은 “그렇다면 진정”이라고 결론 내린다. “애비는 애한테 미역국 먹였건 안 먹였건 무조건 지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겠지. 허나 에미는 진정 계산이 들어간 거지. 사전에 애한테 미역국을 그렇게 퍼먹였다 함은 애 몫을 죽어도 내가 먹겠다, 그런 진정이 있는 거지.” 주란의 말에 규가 심드렁하자 주란은 다시 덧붙인다. “니들은 영영 몰라. 애 없어도 애비 과니까.”
삶의 끔찍함을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랑일까 술일까 아니면 입담일까. 바닥 같은 삶에서 길어 올린 통찰은 연륜의 입담으로 빛나고, 리듬감 있는 서사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작가의 솜씨는 단편에서도 어김없이 진가를 발휘한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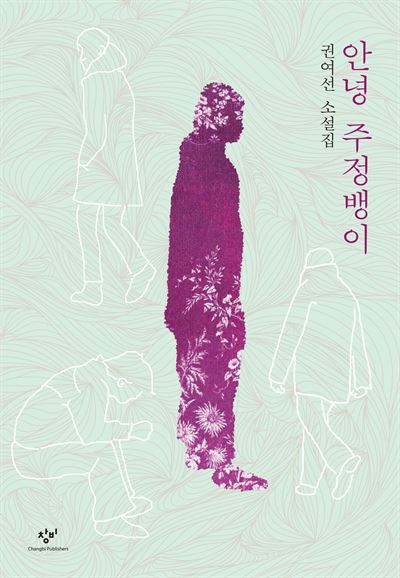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