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정현백 지음ㆍ당대 발행
246쪽ㆍ1만6,000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알려진 대로 미국 부시 정권의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정책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미사여구를 빼고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날 것 그대로의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네 배에 기름이 끼게 하겠다’다. 빚을 얻어 집을 사들이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다시 말해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생긴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할 보수층이 되리라는 얘기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의 난장처럼 두려운 게 어딨던가.
노태우 정권이 ‘중형차’ ‘4년제 대학생 자녀’ 그리고 ‘30평형대 아파트’라는 삼위일체의 조합을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 호명한 것도 크게 보면 이 작업의 일환이다. 그 이후 우리 사회의 풍경은 CCTV 잔뜩 달린 ‘캐슬’ ‘시티’ ‘타운’ ‘팰리스’에 저마다 숨어있는 모양새가 됐다.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위한 책이다. 소유보다 임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더 엄격히 보호하는 오스트리아ㆍ독일 모델을 다룬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저런 책에 간혹 한두 줄 언급되고 마는 ‘붉은 빈(Das Rotes Wien)’ 모델에 대한 분석이다.
‘붉은 빈’같은 별명을 선의로 붙였을 리 없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부상병사의 귀환, 제국 해체와 분할에 따른 급격한 인구 이동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건 우파인 기독교사회당이었는데, 오직 빈에서만 좌파인 사회주의노동당(SDAP)이 이겼다. 완전히 포위된 SDAP로선 가만히 앉아있어도 ‘빨갱이’라 손가락질 받을 판이었다. ‘붉은 빈’은 감히 움직였다는, 그것도 활발히 움직였다는 비판이다.
SDAP의 속사정도 편치 않았다. 소비에트의 길, 독일 사민주의의 길 두 가지가 있었다. 전자가 강력한 권력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후자는 닥쳐올 혁명의 그 날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이었다. 중앙권력에선 패배했으니 전자는 불가능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빈의 질병’이라 불리고, 빈이 ‘폐결핵의 수도’라 불리던 시절이었다. 이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노동자들의 혁명 잠재력을 갉아먹으리라는 후자의 주장도 따를 수 없었다. 빈에서의 실험을 통해 전국적 수준에서 이뤄질 사회주의의 그 날을 예비해보자는 대안이 도출됐다. 빈에서 성공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 SDAP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이 배경 아래 빈의 SDAP 정권은 자신들만의 대규모 사회복지 정책을 감행했다. 가장 핵심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6분의 1로 강제로 인하한 뒤 그 차액 가운데 일부를 주택건설세로 흡수했다. 임차인들 가운데 좋은 집을 빌려 사는 0.5%가 세금의 45%를 감당하고, 싼 집을 빌려 사는 82%가 22%를 부담하는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높은 임대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렇게 걷은 돈에다 복지세 등 다른 재원을 합쳐 1923~34년 공공주택 6만3,071가구를 지었다. 당시 빈의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실업 문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집약적 방식을 써야 하는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짓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목적 사업이었던 셈이다. 이쯤이면 땅과 집을 소유한 이들이 ‘붉은 빈’을 뭐라 비난했을지 안 봐도 훤할 정도다. 반면 집 없는 이들의 지지는 어떠했을까 싶다. 저자는 “2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사회당의 성장에 이 때의 기억이 큰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만 그치면 재미가 덜하다. 저자는 SDAP의 관료적 측면을 지적하는 등 ‘붉은 빈’ 모델의 장단점도 분석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단일부엌운동’이다. 가사노동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릴리 브라운 같은 사민주의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한 것인데,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붉은 빈’에서 실제 성사되기에 이른다.
전후 혁명적 분위기가 진했던 빈에서의 모델이, 이념적 편협함은 더 극단적인 수준인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저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주거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서울 학생과 지방 학생이 다르다. 특히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난민처럼 사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보는 눈, 강남 아이들을 보는 눈, 정서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냐 되묻고 싶다.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가 왜 나오겠는가. 주거 문제 해결은 결국 자본주의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기도 하다. 인간적인, 건전한 생활 여건이 보장되어야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난 우리 사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본다.”
-주거문제는 결국 상상력의 문제라 했다.
“주거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상상력 부족이다. 주거를 사유재산으로만 보니까 ‘주거문제=돈이 엄청 드는 문제=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말만 반복된다. 그게 아니라 주거 권리의 문제로 보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빈 모델 얘기는 역사에 실재했던 그 상상력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붉은 빈’ 모델도 전후 상황에서 나온 예외적 모델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나치의 오스트리아 점령으로 중단될 때까지 10여 년 이상 지속된 모델이기도 하다. 우리 더러 보수가 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보수에 포위된 ‘붉은 섬’으로서 빈의 SDAP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 지지를 이끌어냈는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거 정책이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생활 정치ㆍ엄마 정치의 필요성이다. 진보라 하면 아직도 중앙 정치무대에서 혁명에 준하는 한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한번 곱씹어볼 만한 대목들이 여럿 있다. 그간 축적해온 논문을 쉽게 풀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빡빡한 서술은 다소 아쉽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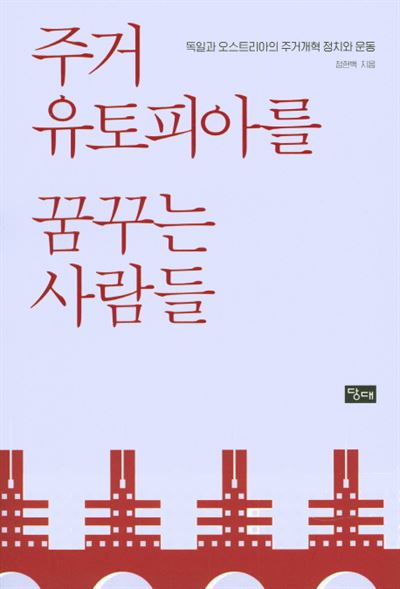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