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심문관의 비망록
안토니우 로부 안투네스 지음·배수아 옮김
봄날의책 발행·576쪽·1만8,500원
이곳의 점령군은 공산주의자도, 파시스트도 아니다. 멜랑콜리다. 포르투갈 팔멜라의 농장을 배경으로 파시즘 군사독재와 사회주의혁명 시기를 그린 안토니우 로부 안투네스의 소설 ‘대심문관의 비망록’은 강자나 약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멜랑콜리에 감염돼 있다. 5명의 주요인물과 14명의 보조인물이 일인칭의 진술 형식으로 토로하는 장대한 이야기는 다성적 목소리의 대위법을 구현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또는 각기 다른 사건을 진술하는 이 목소리들은 서사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 돼 멜랑콜리를 시공간에 공명시킨다.
1932년 군사쿠데타로 포르투갈의 총리가 돼 36년간 독재 한 실존인물 살리자르. 작가는 주인공 프란시스쿠를 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파시스트 권력자의 자리에 앉힌다. 절대권력 ‘장관님’ 프란시스쿠는 팔멜라 대저택과 리스본 중앙정부를 오가며 승승장구 하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런 아내 이자벨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페드루와 사랑에 빠져 아들 주앙까지 버리고 떠난다. 페드루를 몰락시키고 싶은 프란시스쿠의 분노는 그러나 권력 핵심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절대권력자의 심장에 화인처럼 남은 사랑의 상처와 정치적 좌절은 그를 농장의 하녀들을 유린하는 폭압적 색정광으로 전락시킨다. 집사격의 하녀 티티나의 헌신적 보살핌을 받으려 살아가던 그는 살리자르 총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세력을 결집, 반동을 도모하지만, 1974년 일어난 사회주의 성향의 카네이션혁명으로 실패하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간다.
프란시스쿠가 팔멜라 농장에서 저지르는 만행이 고스란히 포르투갈 파시즘 독재의 우화로 읽히는 이 소설은 멜랑콜리의 슬프고 쓸쓸한 어조 덕분에 명쾌한 선악 판결로 귀결하지 않는다. 챕터마다 화자가 다르고, 화자를 특정하기까지 제법 긴 추리를 요하며, 시간과 공간이 마구 중첩되고 삽입되는 스타일이 읽기에 쉽지는 않다. 방대한 분량 외에도 마침표가 없는 문장들,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 챕터 등으로 인해 독서의 초반 적응기가 제법 길다. 하지만 우울한 어조에 실려 전개되는 권력과 사랑의 쟁투 메커니즘은 상당히 흡인력 있다. 예컨대, 아내 이자벨과 놀랄 만큼 비슷한 외모의 아가씨를 발견한 노인 프란시스쿠가 그녀에게 곰팡내 내는 아내의 옛 옷을 입히는 장면. 프란시스쿠는 아기를 밴 하녀를 ‘암소’라고 부르며 수의사에 맡기고, 그로 하여금 “장관님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문에 나서 결국 진실이 된다”며 군말 없이 아기를 받아 입양 보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장관님은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며) “이자벨”… “나를 사랑하는 것 맞지, 이자벨? 장관님이 까치발로 다가와,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주며, 내 이마에 입 맞추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고 “티티나는 그런 일은 영영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언젠가 돌아오리란 걸 알고 있었어 이자벨” 그리고 감송향의 향기에 취해 어느새 잠이 든 나는, 인조 속눈썹이 내 뺨 위로 천천히 떨어져내리는 것을, 고독한 강대의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설은 작중 인물들은 끝내 알지 못하는 진실들을 독자에게만 보여주는 전략으로 슬픔과 멜랑콜리를 배가시킨다. 모른 채 죽는 것이 인생이므로 전략이라기보다 자연스런 모사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오직 홀로이기를 원했던” 이자벨에게 새로운 남자는 떠남의 명분일 뿐이었다. 이자벨에게 “사랑과 사랑 아님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며 “(그 둘 모두)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고, 사람보다 먼저 있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지 않고, 사람의 뒤를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다. 모두의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 지배했던 자에게도, 지배 받았던 자에게도 들이닥치는 몰락이 오랜 독서 끝에 싸한 멜랑콜리로 남는다. 안투네스의 소설이 국내에 번역된 건 처음으로, 소설아 배수아씨가 독일어본을 중역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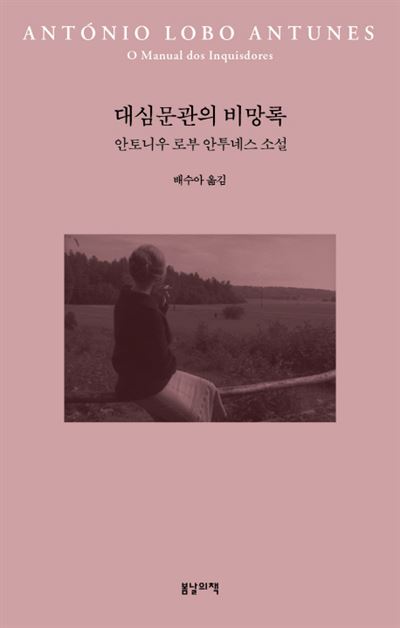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