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6세기 유대 왕국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약 5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바빌론 유수). 당시 유대인들은 이국 땅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기록하고 회당을 만듦으로써 구약성서와 유대교 체계를 정립했다. 구약성서 시편엔 이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른 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바빌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버릴 것이다. 내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국제카톨릭성서공회, ‘해설판 공동번역 성서’, 도서출판 일과놀이, 1996)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과오로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함께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잘못으로 상실한 것의 이름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곤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자 노력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이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온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모두 헛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시 봄이 왔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제주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곳에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또래들이, 봄을 맞이한 대학 캠퍼스에 가득하다. 만약 그들이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만약 선원들이 그들을 먼저 대피시켰더라면, 만약 해경이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만약 그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이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날 우리의 하루도 어쩔 수 없이 기억한다. 섣부른 낙관에 기대어 우리는, 여느 때처럼 일상을 보내며 그들이 모두 구조되어 남해 어느 항구에서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짐작했다. 4월 16일 평온한 삶을 산 우리는 그날의 비극에 모두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성찰과 의식적 노력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노예로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망국의 과오를 기록하고 회당을 만들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바빌론 유수는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조건 없이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극적으로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찰적 노력 없이 그 기적이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 동화되었다면, 키루스 2세가 그들을 유대교 경전과 제사도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2년 전 4월 16일의 일과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기록하는 것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하나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귀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국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진상 규명은 단지 어떤 해상 사고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국가 체계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설령 그것이 그날의 과오를 드러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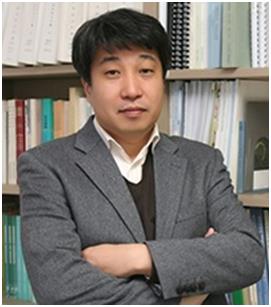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