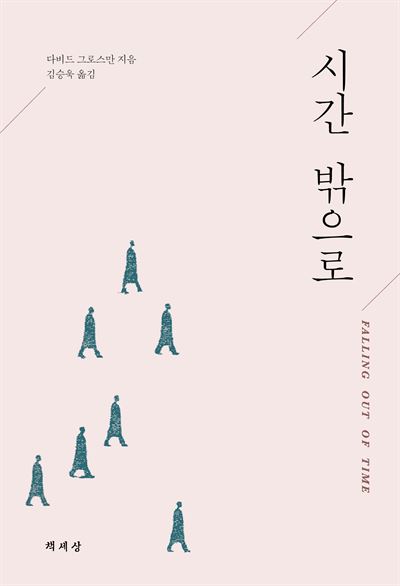
시간 밖으로
다비드 그로스만 지음·김승욱 옮김
책세상 발행·252쪽·1만5,000원
이스라엘 국민작가 그로스만
아들 전사한 비극 자전적 글로
모든 부모가 자식 잃은 마을
끝없는 거대한 고통만 남아
애도의 悲歌, 4월 한국에도…
이 작품의 장르를 묻는다면 슬픔이라고 답해야 옳다. 주제도 슬픔이고, 주인공도 슬픔이다. 사건 역시 슬픔이란 말 외엔 마땅히 일컬을 단어가 없다. 아니, 한낱 슬픔이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꺽꺽 대는 울음이 새나오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슬픔의 핏덩어리가 시공간의 막을 찢고 나올 듯 버티고 있는 곳. 이곳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도무지 끝나지 않는 생의 참혹을 겪고 있는 마을이다.
이스라엘 국민작가로 불리는 다비드 그로스만(62)의 ‘시간 밖으로’는 시와 연극, 우화와 종교적 기도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장르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다 할 사건도, 구체적인 시공간도 제시되지 않는다.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척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름 없는 인물들의 독백이 이어질 뿐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호소해온 이스라엘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평화운동에 앞장서온 이 작가는 2006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레바논과의 전쟁 중 사망하는 비극을 겪는다.
작품의 서두에 아내와 저녁식사를 하던 남자가 불현듯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을 떠날 때, 이 슬픔의 책이 작가의 자전적 작품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난 가야 돼./ 어디로?/ 아이에게로./ 어디로?/ 아이에게로, 그곳으로./ …당신이 그러니까 무서워./ 아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아들의 죽음 후 5년이 지난 때였다. “슬픔의 교수대에서 5년을 보”낸 남자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죽음의 세계로 떠나고, 여자는 남편이 “시간이 둘러준 얄팍한 압박붕대를 뜯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챈다. “그래야 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곳을 향한 여행의 양식.”
남자는 ‘걷는 남자’가 되어 마을 주변을 빙빙 돌고, 아들과 딸을 잃은 켄타우로스와 산파, 구두장이, 나이 많은 수학교사 등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걷는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이뤄 자식을 다시 만나기 위한 걷기의 여정에 동참한다. 손으로 흙을 파 각자의 무덤에 들어가 눕기까지 그들이 번갈아 들려주는 고통의 토로가 작품의 주를 이룬다. 마을을 다스리는 공작 역시 아들을 잃었다. “팔월에 아들이 죽었다,/ 그 달이 끝난 뒤 나는 궁금했다./ 내가 어떻게 구월로 나아갈까?/ 아들은 팔월에 남아 있는데.” 걷는 사람들로 뭉뚱그려진 이 참척의 집단은 합창한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아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봐 무서워요. 잘 자라, 아가야, 나무 위에서, 바람 불 때. 그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
작가는 존재하는 부재, 아니 부재하는 존재를 끌어 안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을 “시간 밖으로 쓰러진 자”라고 명명한다. 그들은 살아 있으되 현재에 살지 못하는, 시간 바깥으로 축출된 망명자들이다. 4월의 대한민국에서 이 망명자들의 울음소리는 비수처럼 벚꽃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 ‘너’를 다시 잉태하겠다는 슬픔과 애도의 비가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끈질기게 시도한다. 아직 내 안에/ 살아 있는 너의 세포들, 내 감각기관의 말단에서/ 아직 희미해지지 않은 존재의 마지막/ 각인을 소생시키고, 깨우고,/ 한없이 복제한다.” 걷는 남자가 “추억과 고통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고 말할 때, “그 아이는 죽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은 죽지 않았어”라는 켄타우로스의 문장을 읽을 때, 우리에겐 하나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4월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

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