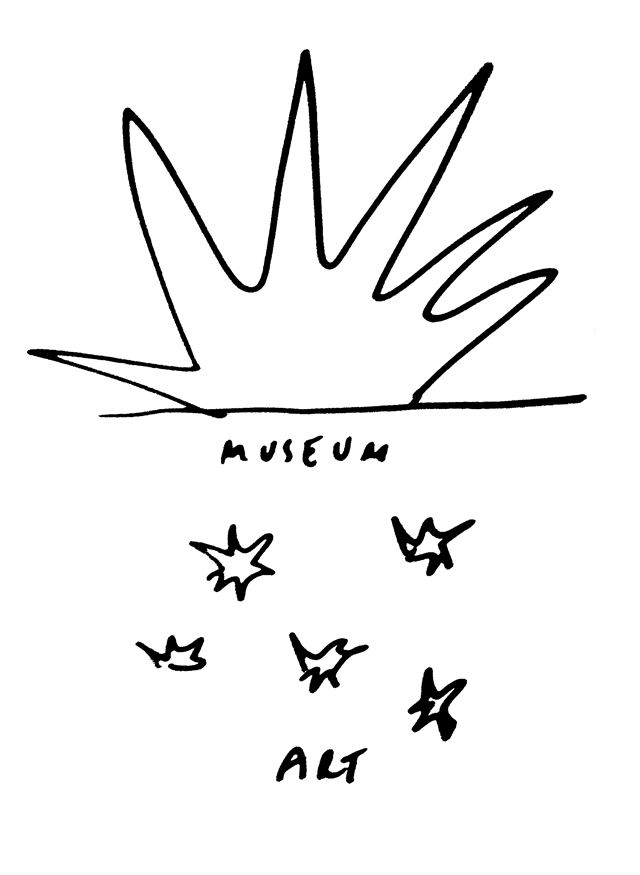
“미술관 건축물이 하이퍼 리얼리티의 닻을 올려놓는 바람에 글로벌 자본의 비물질화된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탈신체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도입부 이 문장만 보고 ‘쳇 이 놈의 예술책, 또 쉬크와 아방가르드가 난무하겠구만’ 궁시렁대며 바로 책을 덮을 필요는 없다. 뒤이어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은 고도의 개별화된 예술적 통찰을 얻는 대신, 예술에 앞서 먼저 공간에 도취된다”는 비교적 친절한 문장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동시대(컨템포러리) 미술은 요즘 각광받는 아이템이다. 여기저기서 아트 페어를 열고, 젊은 작가를 초청하고, 멋진 미술관 건립계획을 발표한다. 이 미술관들의 공통점은 고전적 ‘화이트 큐브’에 대한 거부다. 희한하게 건물을 비비 꼬아 짓는 ‘스타건축(Starchitecture)’ 열풍이다.
미술평론가 클레어 비숍의 ‘래디컬 뮤지엄’은 이에 대한 반기다. “건축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새로운 미술관의 아이콘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지만 그게 곧 동시대 예술은 아니다. 단지 “이미지의 층위, 즉 새로운 것, 쿨한 것, 사진 찍기 좋은 것, 잘 디자인된 것,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것의 층위에서” 동시대성이 소모되는 것일 뿐이다.
건축의 문제는 작품의 문제로 이어진다. 요란해진 건물에 들어가려니 작품에겐 두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거대한 후기산업적 격납고 안에 마치 길 잃은 것” 같은 작품이거나, 혹은 “건물의 외피와 겨룰 정도의 초대형 사이즈”가 되거나.
대안은 무엇인가. 비숍은 동시대 예술은 시공간의 역사성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시공간의 역사성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장르라 정의한다. 네덜란드의 반아베미술관, 스페인의 레이나소피아미술관, 슬로베니아의 메켈코바 미술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세 미술관은 희한한 현대건축물도 아니요, 그 이름도 기업가ㆍ여왕ㆍ군사기지에서 따왔지만 가장 동시대 예술에 충실하다.
옛 발전소만 개조하면 ‘한국의 테이트모던’이요, 지하공간에 그림을 걸어두면 ‘한국의 지추미술관’이라는 식의 나라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참고해볼 만하다. 책 곳곳에 있는 귀여운 낙서는, 아니나 다를까 단 페르조브스키 작품이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