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리처드 포드 지음·곽영미 옮김
학고재 발행·560쪽·1만5,000원
리처드 포드의 장편소설 ‘캐나다’는, 그 이상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뭉클한 작품이다. 중산층 가족의 해체라는 미국 작가들이 유난히 집착하는 주제와 이 주제가 나오면 패키지처럼 구사되는 ‘완만하고 섬세한’(으로 쓰고 ‘지루하고 늘어지는’으로 읽는) 문체. 560쪽의 분량 중 주요사건이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게 128쪽이니, 쉽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 후회할 일은 결코 없다. 포드가 ‘스포츠라이터’의 작가이고, 퓰리처상과 펜/포크너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한 인간의 삶에 들이닥친 불행,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이 근원적 질문을 소설은 슬프고도 애달프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프랑스 페미나 외국소설상을 수상한 ‘캐나다’는 도발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우선 우리 부모가 저지른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다음에는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야기한 여진이 핵심임을 선포하며 소설은 시작한다. “이 세상에 절대로 은행을 털지 않을 사람이 딱 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진술이 공허하게도, 15세 쌍둥이 남매를 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는 은행강도가 된다. 호방하고 낙천전인 공군 대위 출신의 아버지와 우울하고 사색적인, 대학에서 시를 전공한 어머니는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 결혼했지만, 그것이 섣부르고 그릇된 선택임을 이내 깨닫게 된다.
화자인 아들 델은 사업가의 수완이 초래한, 살해의 위협에 시달릴 정도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가 강도짓을 떠올린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별 넘치고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했던 어머니가 그 파멸적 행각에 동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멸의 거대한 그림자가 뒤덮은 줄도 모른 채 펼쳐지는 하위 중산층 가족의 평범해서 저릿한 일상, 스스로를 내던지며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 했던 아들의 운명과 끝내 옥중 자살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절망…. 이 모든 것들은 65세의 영어교사가 된 아들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건져 올린 사색과 어머니의 옥중일기 덕분에 사후 규명될 뿐이다.
캐나다는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딱지와 청소년보호시설에 방치될 운명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어머니가 치밀하게 계획한 모정의 안전지대였다.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후 캐나다로 밀입국해 살아가는 하버드대 출신 미국인에게 밀수된 소포처럼 보내진 소년은, 다시는 아이들을 못 볼 줄 이미 알고 마지막 편지를 썼던 어머니의 표현처럼, ‘마음의 한대(寒帶)’를 지닌 채 힘겨운 캐나다 생활을 해간다. 그 운명이 싫어 몰래 달아난 한 몸 같았던 누이와 달리, “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좋은 아들로 남았”던 델은 캐나다인으로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을 산다.
“나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지우고 싶어 했는지를, 내 행복이 얼마나 그들의 소멸에 묶여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캐나다의 은퇴 교사로 살아가던 델이 임종을 앞둔 누이를 50년 만에 만나는 마지막 대목은 소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누이가 건넨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그 파국적 사건을 돌아다보니 “우리가 재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징조들, 경고들은 대체로 잘못돼 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일렁이는 파도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있었다고, 타락과 실패의 운명을 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만 그릴 수가 없다.” 인간을 선과 악의 두 범주로 명쾌하게 분류할 수 있다면 소설이란 장르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처에 성찰로 가득한 섬세한 문장들, 그 자체가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다.
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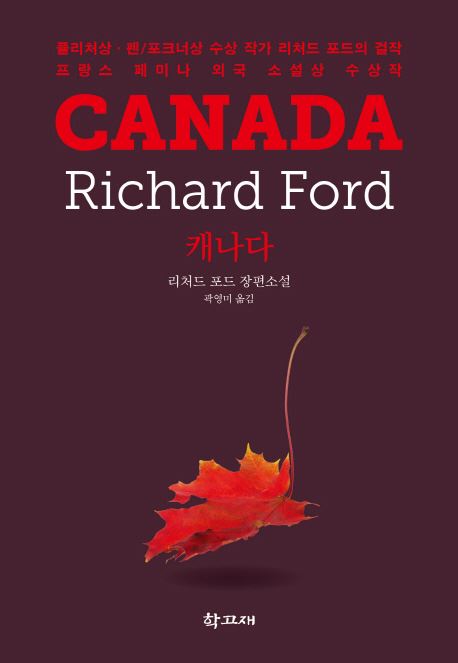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