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 위의 인문학
사이먼 가필드 지음ㆍ김명남 옮김
다산초당 발행ㆍ576쪽ㆍ2만8,000원
한국의 전통놀이 중 ‘땅따먹기’라는 놀이가 있다.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혹은 운동장 구석에서 흙바닥에 커다란 원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 안에서 얇은 돌멩이를 튕겨서 세 번 안에 자기 땅에 돌아오면 그 돌의 행로 안쪽은 자기 땅이 된다. 정확한 유래가 불분명한 이 놀이는, 어쩌면 지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놀이일지도 모른다. 텅 빈 대지의 모습은 더 알고 싶은 욕망, 더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18세기 제국주의 시대 유럽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놀이터의 모래사장 대신 아프리카 지도 위에서 땅따먹기를 했다.
160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지도 중 가장 인기 있는 지도는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 빌럼 블라우의 ‘새로운 아프리카’였다. 정보가 부족했던 아프리카 내륙은 대부분 상상과 뜬소문으로 가득 찼다. 반면 1749년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제작한 아프리카 지도는 과학적 정확성에 초점을 두었기에 내륙을 텅 빈 공간으로 남겨놓았다. 1세기 후 이 공백지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영토가 표기됐다. ‘암흑의 핵심’에서 아프리카 식민지 현실을 관찰한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는 “정보로 가득 찬 지도가 아니라 텅 빈 지도가 상상력을 발휘할 가능성과 새로운 땅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에는 사람의 행동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지도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보는 이의 위치를 알려주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영국 언론인 사이먼 가필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라토스테네스부터 현대의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눈으로 지도를 만들고 세상을 알기를 원했던 이들의 열망 어린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내용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지도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비슷하다. 먼저 자기 위치를 찾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세계로 출발한다. 최근에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로 세계 주요 도시 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도가 1250년 영국에도 있었다. 매슈 패리스라는 수도사가 그린 지도는 런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알려준다. 내용의 정확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영국 사람들은 이 지도만 보고도 성지를 순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도 있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지도는 더욱 정밀하게 바뀌었다. 고대 세계지도는 아시아를 위쪽에 두고 아래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중해로 갈라 놓은 것이 전부였던 ‘T-O 지도’였다. 1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그린란드 너머까지 가서 발견했다는 땅은 ‘빈랜드’라는 이름의 작은 섬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제대로 표시된 위성 지도를 보고 있다.
이제 전인미답의 땅은 지구 상에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도를 통해 여행한다. 소설가와 게임 제작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지도를 그려냈다. 판타지 마니아들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의 ‘중간계’와 게임 ‘엘더스크롤’ 속 대륙 ‘탐리엘’을 헤맨다. 지도 한 장만 믿고 보물을 찾아나선 짐 호킨스의 이야기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작가에겐 지도가 있어야 한다. 지도를 들여다보노라면 그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의 말대로 아직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는 우리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은 세계까지 말이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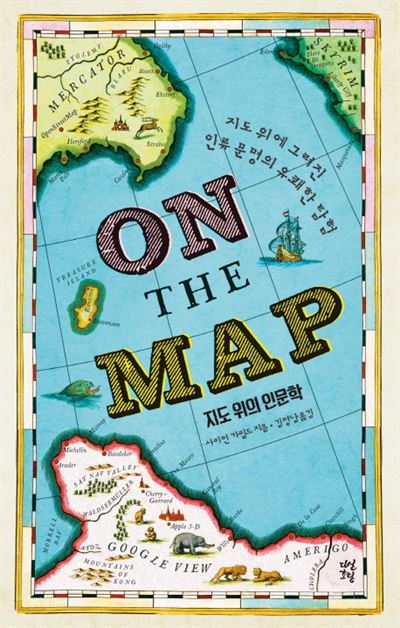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