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합병해 글로벌 IB 출항
자본 8조원 확보해 인수 역량 갖춰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새 계기 기대

뭔가 기운 돋는 얘기로 한 해를 맺고 싶다. ‘샐러리맨 신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야망과 도전을 새삼 곱씹는 이유다.
지난 2007년은 글로벌 기업 인수ㆍ합병(M&A)이 가장 격렬했다. 전체 M&A 규모가 무려 4조3,000억 달러였던 것으로 평가(톰슨로이터)됐다. 그런데 그 기록이 올해 깨졌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M&A 규모는 4조6,000억 달러에 달해 명목가치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약간 다른 통계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1년 간 세계의 산업ㆍ기업 구조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다는 건 분명하다.
비즈니스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탄생하고 성장하다 늙어간다. M&A는 기업이 공세적 사업 확장을 위해, 또는 쇠퇴 위험에 맞서 새로운 사업과 조직, 재무구조를 접목해 비즈니스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는 적극적 경영행위다. 따라서 M&A가 격렬했다는 건 지난 1년 간 글로벌 경제여건이 수많은 비즈니스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숨가쁘게 돌아갔다는 얘기일 것이다.
지난 11월에 단행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아일랜드 제약사 엘러간의 M&A는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노린 ‘꼼수합병’이라는 비난을 샀다. 하지만 총액 1,600억 달러(186조원)에 달한 양사 합병은 향후 바이오산업으로까지 확장될 글로벌 제약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절실한 포석이기도 하다. 에너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로열더치셸과 BG그룹의 M&A나, 맥주회사인 AB인베브와 사브밀러 간 M&A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 부응한 비즈니스 체질 변화 시도라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다.
M&A 열풍은 기업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만 해도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올 들어 각각 5,160억 달러와 850억 달러를 해외 M&A에 쏟아 부었다. 특히 중국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9%나 폭증한 19억 달러를 한국 기업 인수에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깥의 격동에도 국내의 비즈니스 체질변화 시도는 저조했다. 당장 조선ㆍ철강ㆍ해운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후장대 산업만해도 진작부터 구조조정이 요구됐으나 끝내 획기적 전환점을 다지진 못했다. 산업ㆍ기업 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안’조차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답답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숨통 트이는 듯한 얘기를 만들어 낸 사람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의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입찰에서 경쟁자보다 2,000억원을 더 쓰는 승부수를 던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연봉 1,500만원의 증권맨으로 출발한 박 회장은 30년 질주 끝에 미래에셋증권과 거함 대우증권을 합친 자본금 8조원의 국내 최대 증권사를 이끄는 새로운 신화를 쓰게 됐다. 하지만 상쾌한 건 박 회장의 성공스토리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향한 그의 야망과 비전이다.
증권사와 글로벌 IB를 가르는 본질적 차이는 인수(언더라이트ㆍunderwrite)역량이다. 보통 증권사들은 발행된 증권의 거래를 중개하여 얻는 수수료 수익에 의존한다. 하지만 글로벌 IB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 유통시키기에 앞서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계획된 자금을 수요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한 마디로 증권 유통뿐 아니라, 자본 공급과 재무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물론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사의 자본금 8조원은 세계 최대 IB인 JP모건체이스의 253조원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시아 최대 IB 경쟁에 뛰어들어 우리 금융산업의 새 지평을 열 기반은 될 만하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 있음을 오랜만에 확인해준 박 회장의 연말 M&A 한 건이 국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의 새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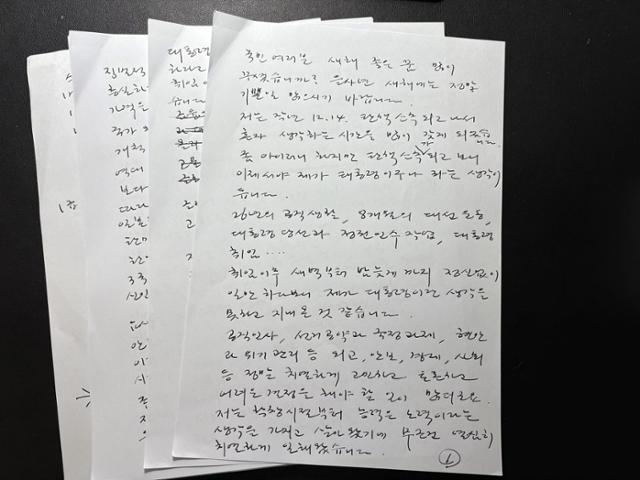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