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들레르에게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과 불행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현실은 지옥이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만이 그 악과 불행의 무게를 떨치고 인간의 정신을 무한으로 열 수 있는 문이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선으로부터도 악으로부터도 쏟아진다. 그는 ‘아름다움에 바치는 찬가’에서 쓴다. “그대 하늘에서 왔건, 지옥에서 왔건 무슨 상관이랴?/ 오 ‘아름다움’이여! 끔찍하되 숫된 거대한 괴물이여!(…)운율이여, 향기여, 빛이여, 오 내 유일한 여왕이여!―/ 세계를 덜 추악하게 하고, 시간의 무게를 덜어만 준다면!”(‘악의 꽃’ 윤영애 옮김ㆍ문학과지성사)
처절한 느낌마저 주는 이 ‘미의 왕국’에 대한 꿈이 단순히 불행한 현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만 구상되었을 리는 없다. 보들레르에게서 그 정점을 찍은 예술지상주의의 추구는 언어예술의 능력에 대한 낭만적 환상에 얼마간 기대었을지언정, 쉬운 오해처럼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기보다는 속악한 현실에 대한 거부에 더 강조점이 주어져야 할 테다. 그것은 언어와 정신의 가능성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현실의 창조와 구축을 바로 그 언어의 미학적 질서 속에서 실현해보려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리고 보들레르가 말하는 ‘악’은 아마도 그 자신의 방랑과 탕진, 타락의 유한한 삶을 포함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제2제정기의 구역질 나는 현실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는 환멸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동지라고 믿었던 ‘구제불능의 여인들’과 ‘버림받은 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자 그가 그렇게 찬미했던 ‘군중’이라는 존재와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한다. 그러면서 그 무력하기만 한 싸움을 위해 스스로 시인의 ‘후광’을 벗는다.
삼십 년 가까이 문학판 언저리에서 살아왔다. 그 동안 문학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몇몇 문학출판사는 꽤 큰 규모로 성장했다. 서양 근대문학에서는 보들레르라는 이름이 자주 상징적 예시가 되기도 하거니와, 문학의 자율적 공간에 대한 신화는 그 추구의 정점에서 가장 극적이고 진실한 균열을 드러냈다. 그런데 한국 근현대문학의 짧지만 굴곡 많은 시간을 돌아보면, ‘자율성의 신화’는 때론 오해되고 남용되기도 하며 문학사의 무대에 출현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이어가면서 시대 현실을 포함하는 좀더 온전한 인간 진실의 탐구에 시인 작가들의 노력이 집중되었던 것 같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문학은 ‘창비’와 ‘문지’라는 두 문학 그룹 간 비판적 대화와 긴장이(물론 다른 많은 지성과 지혜의 실천도 더해지면서) ‘문학과 현실’의 균형추를 모색하는 데 창조적으로 기여하면서 한국문학의 자립과 풍성함을 이끌었다. 이 시간들을 어떤 깊은 감회나 감동 없이 돌아보기는 쉽지 않다. 보들레르가 벗어버리고자 한 ‘후광’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국문학에 드리워졌다면 바로 그 때문이리라. 문학을 부수어서라도 세상을 바꾸어보려 했던 80년대가 있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시장’이라는 현실이 문학과 문학제도 속으로 한층 깊숙이 들어오면서 한국문학의 전선은 더욱 복잡하고 착잡해졌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누군가 쓰고, 누군가 읽고, 누군가 생각하는 자리에 ‘문학’이란 행위가 있는 거라면, 그리고 거기 한국문학의 지난 시간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면, 그리고 변화와 모험, 이질적인 것들과의 뒤섞임이야말로 문학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새긴다면 착잡함을 눅일 이유는 많다. 올 한 해 한국문학을 향해 쏟아진 많은 고언들도 같이 되새길 일이겠다. 그러께 문학동네 20주년 자리의 뭉근한 감회가 떠오르는데, 창비는 50주년이고 문지는 40주년이란다. 긴 세월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학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면 그건 다른 모든 세상의 일들에 의미가 있는 것과 똑같은 지점에서 그러하리라.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정홍수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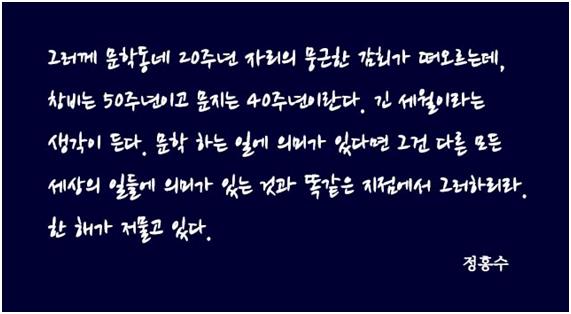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