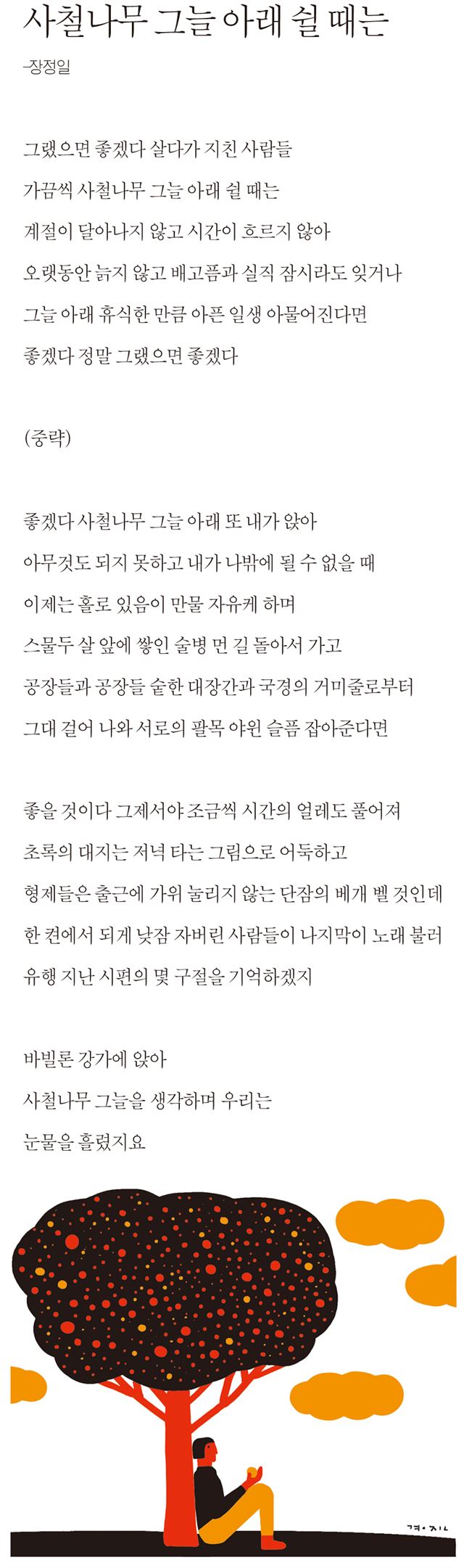
스물두 살 이후로는 이 시를 자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의 정부라는데, 그 나라가 망해 노예로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중얼거리던 시죠. 큰 나무의 널직한 그늘 아래 편히 쉬는 모습을 상상하며 읽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키 작은 사철나무 아래에서는 몸을 쉰다기보다는 숨긴다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식물도감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아래 잎도 위 잎을 밀치고 나오려는 욕심을 피우지 않고 주어진 만큼 광합성을 하면서 큰 불평 없이 서로 잘 어울려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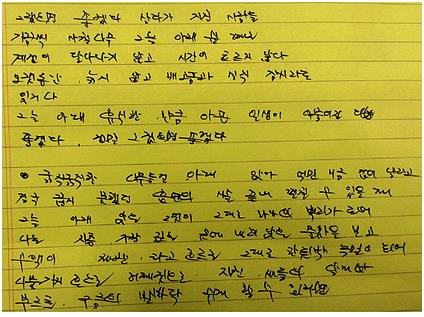
한 해고노동자의 유서 뒷장에 이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 불평 없이 자라던 아래 잎도 떼어내 버리는 손 때문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바빌론 강가에 있어요.
시인ㆍ한국상담대학원대학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