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관이 본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평결비판서 펴낸 것은 처음
“다수의견만 기억되는 풍토 안타까워, 다양한 시각 토론에 도움됐으면”
삼성 사건 판결 “형식주의 경도돼 삼성 제3자 배정에 눈감아” 비판

최초의 여성 대법관, 국민 기본권을 대변하는 소수의견의 피력,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청탁금지법 추진 등. 법관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는 행보로 법조계에 굵직한 획을 그어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단독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를 펴냈다.
대법관 시절 직접 관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중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을 골라 조목조목 반추했다. 존엄사, 사학비리, 성소수자 차별, 출퇴근 재해, 퇴직금제도 등을 둘러싼 판결 등을 다뤘다. 국내에서 전임 법관이 에세이나 회고록이 아닌, 자신이 참여한 판결의 공과를 분석한 본격 평결비판서를 펴낸 것은 처음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사건 당시 사회적 배경과 논의 흐름 ▲각 판결의 다수 소수 별개의견에 담긴 법의 논리 ▲당시 밝힐 수 없었던 개인견해와 아쉬움, 반성 ▲판결 이후 변화 등을 망라했다.
김 전 대법관은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여러 어려운 논쟁을 헤쳐왔는데, 판결문이 길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결론만 기억한다”며 “법관 사이에도 ‘열심히 쓴다 한들 소수의견을 누가 읽느냐’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다수의견만 기억되는 풍토가 안타까워 당시 쟁점 및 토론과정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 애를 썼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특히 삼성 그룹의 신주 저가발행 사건, 새만금 사건 등의 판결에 대한 완곡하지만 날 선 비판이 오롯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사회가 액면총액 10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배임죄를 더 깊이 파고 들어 시각을 완전히 바꿔 판결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당시 다수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형식을 가장해 추구하는 실질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까지 형식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략) 다수의견의 선택은 형식과 실질을 혼동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배정이라는 형식을 가장한 제3자 배정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경도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72~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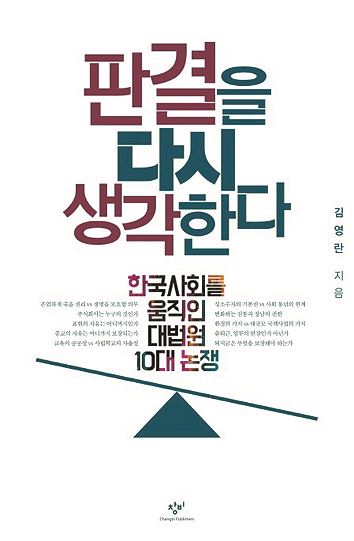
새만금 사건을 돌아보는 대목에서는 “법원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큰 숙제를 던진 사건”이라며 “이미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으므로 어떻게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은연 중에 작용한, 혹은 막대한 돈이 투자된 이상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개발주의 지향주의 사고가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적 검토를 하더라도 각 사건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의미를 보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시각과 법률적 시각이 부딪힐 때는 ‘기승전-헌법’, ‘기승전-국민주권’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제3자인 것처럼 분석하고 보니 놓친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있을 때 잘하지 왜 나와서 언급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겁이 났지만 결론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과정은 모른 채 결론만 기억하면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을 좀처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는 정답을 꼭 찾아야만 한다는 정답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법률은 더 그래야 한다고들 하는데,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법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근대법의 토대인 국민주권, 기본권 보호의 원리는 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고 플래시를 켜서 얼굴에 들이대고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회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판결에 대해 “대과가 여기저기서 보였고 소과는 일일이 말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었다”고 몸을 낮춘 그는 “이런 회의와 아쉬움을 가감 없이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 같은 기록이 사법부 발전에 보탬이 되길 희망했다.
“법에도 미지의 어둠이 있으며, 그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은 미지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면 다행이리라.”(295쪽)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