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마틴 데일리, 마고 윌슨 지음ㆍ김명주 옮김
어마마마 발행ㆍ492쪽ㆍ2만2,000원

인간은 왜 서로를 죽일까. 악해서, 못 배워서, 학대를 당해서, 사회 구조가 잘못 돼서, 처벌이 약해서, 총을 사기가 쉬워서, 뇌 구조가 남 달라서….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살인의 이유들 중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필요해서”다.
살인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행위라면 거기엔 생존에 맞먹는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살인에 당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나 더 위험한 건 어떤 위험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것이다. 부부 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이 함께 쓴 ‘살인’은 인간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진화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드문 책이다.
알다시피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행위를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의 산물’로서 관찰한다. 이 학문은 종종 대중의 반감에 부딪친다. 일례로 남성이 엉덩이가 큰 여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이란 가설은, 첫째 마치 외모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둘째 인간을 ‘생존 기계’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인상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특정 심리에 대해 원인을 알기보다 정죄하고 싶어한다. 하물며 살인이랴.
저자들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박으로 문을 연다. 살인을 위시한 폭력이 흔히 ‘벗어나야 할’ 원시성 혹은 미성숙함으로 설명되지만, 원시 사회에서 더 많은 폭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으며 폭력의 대다수가 미성숙한 어린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살인이 ‘인간이 덜 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왜 자꾸 반복될까. 저자들은 친족 살해, 자식 살해, 부모 살해 등 살인의 종류를 나눈 뒤 원시 부족의 문서에서부터 디트로이트 경찰국 살인사건 기록까지 방대한 자료들을 끌어와 그 원인을 파헤쳐 들어간다. 그 중 매우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이 ‘언쟁에 의한 살인’이다.
1980년 9월 5일 금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다운타운의 모닝사이드 공원에서 24세의 남자가 30세의 다른 남성과 싸우던 중 총에 맞아 죽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살해됐고 이 흔해빠진 사건은 신문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사회학자 마빈 볼프강이 1948~1952년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사건 파일을 조사한 결과 살인 사건의 동기 중 가장 높은 37%를 차지한 것은 “모욕, 욕설, 밀침 같은 비교적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된 언쟁”이었다.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의 언쟁,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저자들은 이 살해 동기를 ‘분노조절 장애’ 혹은 ‘욱하는 성미’ 등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평판, 체면, 사회적 지위, 지속적인 관계 같은 더 큰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원시 시대는 물론이고 국가가 무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한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부족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남성으로서) 결정적인 사회적 자산이 되며,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개척민을 살해한 인디언 800명을 죽임으로써 정치적 토대를 다졌다. 자신을 만만히 볼 수 없도록 손에 피를 묻히는 남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이는 번식률의 비약적 상승을 가져왔다. “물러나면 끝장”이라는 심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남성들이 분쟁의 자리에서 선을 넘고 만다. 이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밀리지 않기 위한 ‘필요’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이 연구가 ‘살인이 적응의 산물’이라는 근거로 쓰일 것을 경계한다. 책의 핵심 미덕은 살인 정당화가 아니라, ‘왜’가 허용되지 않던 영역에 그 깃발을 꽂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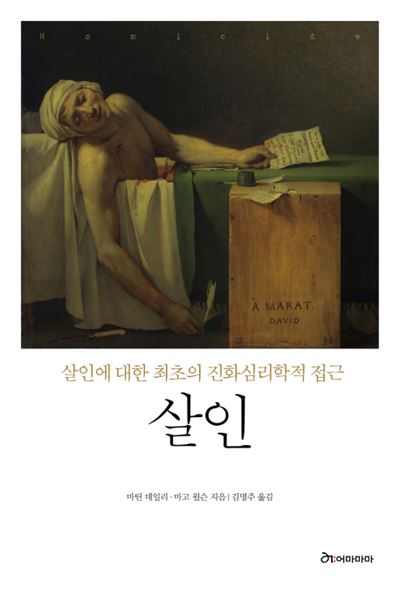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