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피루스에서 페이스북까지 소셜 미디어의 2000년 역사
소셜 미디어 2000년
톰 스탠디지 지음 노승영 옮김
열린책들 발행 408쪽 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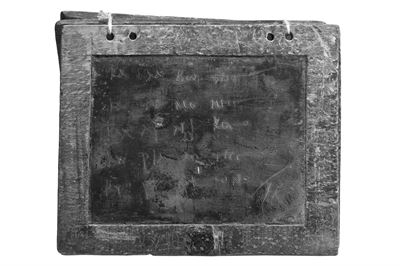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출입문에 붙인 ‘95개 논제’가 인쇄물의 형태로 독일 전역에 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주다. 21세기 한국이라면 예상 소요시간은 약 2시간. 면죄부에 불만이 많던 네티즌들이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트위터의 ‘리트윗’을 통해 미친 듯이 게시물을 돌려댈 것이고 곧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논제’와 ‘루터’가 나란히 오르며 점심 식탁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유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16세기 ‘논제’가 퍼진 방식과 오늘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 공유 방식은 상당부분 일치한다. 첫째,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이다. SNS의 편리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논제’의 이례적으로 빠른 공유 뒤에는 유럽 250개 도시에서 활발히 돌아가던 1,000여대의 인쇄기가 있었다. 인쇄기가 몇 십 년만 더 늦게 발명됐더라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둘째, 정보의 수용자가 유포할 내용을 결정하고 유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인쇄기의 발명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으나 당시 민중이 택한 것은 루터의 글이었다. 가톨릭교회가 발행한 소책자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정도로 인기 없었던 반면, 루터의 책자는 1523년 벌써 400쇄를 찍었고 종교개혁 첫 10년 동안 600만부가 인쇄됐다. 민중이 정보 유포에 참여해 “어떤 메시지를 퍼뜨릴 것인지를 공유, 추천, 복제를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현대의 SNS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보 교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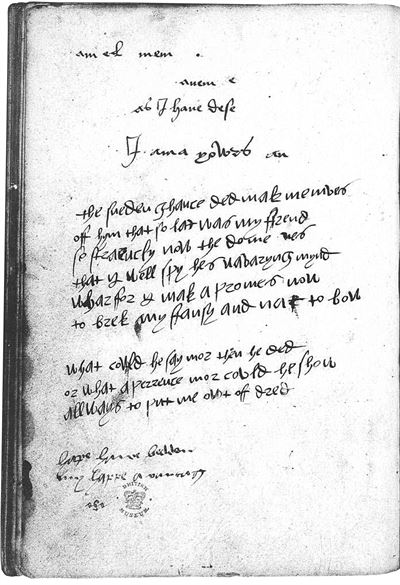
이코노미스트 부편집장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인 톰 스탠디지의 ‘소셜미디어 2000년’은 인류 역사 2,000년 안에 숨겨져 있는 소셜 미디어의 흔적을 좇는다. 고대 로마의 관보였던 ‘악타 디우르나’, 전세계 담벼락에 그려진 낙서(그리고 거기 딸린 ‘댓글’), 15세기 인쇄술 발명 이후 만들어진 소책자들, 그리고 18세기 커피하우스까지 인류는 언제 어디서나 공유하고 추천하고 복제했으며, 이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소셜 미디어의 역사적 보편성을 증명한 뒤 그것이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19세기 중엽 대형 신문과 잡지를 필두로 한 매스 미디어가 정보 배포권을 독점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뤄지던 양방향의 정보 공유는 사라지고 대중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배급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저자는 매스 미디어가 득세했던 지난 150년을 소셜 미디어의 유구한 역사가 끊어진 이례적인 시기로 분석하며 텔레비전이 그 정점에 있다고 말한다.
“방송 모델은 텔레비전 시청자의 역할을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보를 창조하고 배포하고 공유하고 재창조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는 미디어 체계와는 극과 극이다. 텔레비전은 소셜 미디어와 정반대다.”
이렇게 보면 SNS의 등장은 탄생이 아닌 부활이다. 저자는 2010년 튀니지의 대규모 시위로 촉발된 ‘아랍의 봄’을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비유하며, 오늘날 SNS 이용자들은 단기 유행의 추종자가 아닌 놀랄 만큼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전통의 ‘본의 아닌’ 계승자라고 말한다. 최근 SNS로 인해 촉발되는 각종 폐해―허위 정보 유포, 불법 자료 공유, 스마트폰 중독 등―는 현재의 SNS를 완성된 형태의 소셜 미디어라 칭하기 망설이게 만들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좋아요’든 ‘리트윗’이든 인간의 정보 창조, 배포, 공유 본능은 시대마다 형태를 달리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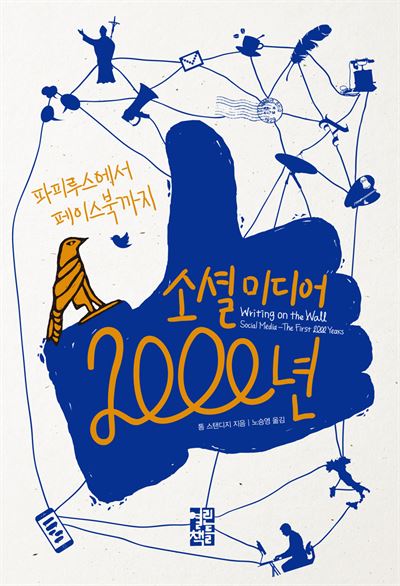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