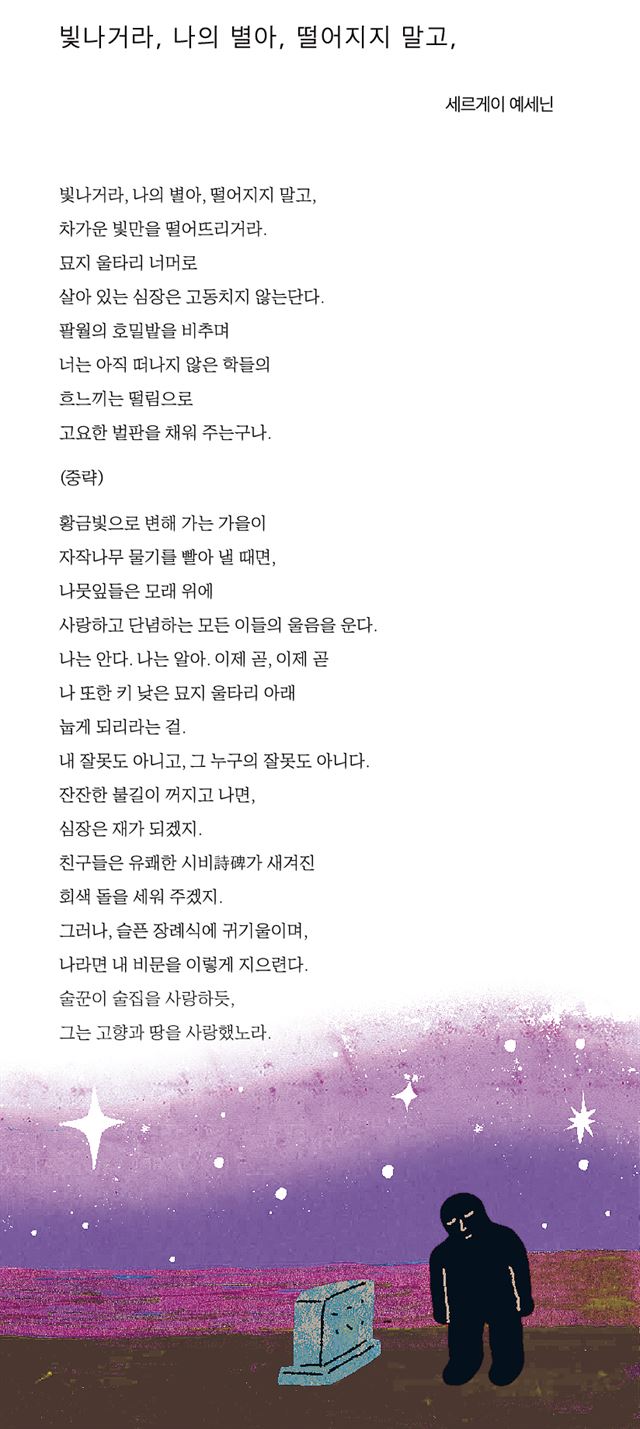
모두들 예외 없이 키 낮은 묘지 울타리 아래 누워 자신의 삶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시간을 맞이하겠지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의 문장처럼 익살스러운 묘비명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라는 릴케의 문장처럼 아름다운 묘비명이 더 나을까요?
묘비명을 미리 떠올린다는 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불길한 느낌을 주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거쳐왔고 앞으로 거쳐가야 할 시간을 표현하는 한 줄을 미리 골라보는 건 삶의 여정에 길잡이를 해주는 별을 찾아내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어떤 문장이 좋을지 내내 생각해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하늘에 그 한 줄을 쏘아올리며 소망해야겠어요. ‘빛나거라, 나의 별아, 떨어지지 말고’.
진은영 시인ㆍ한국상담대학원대학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