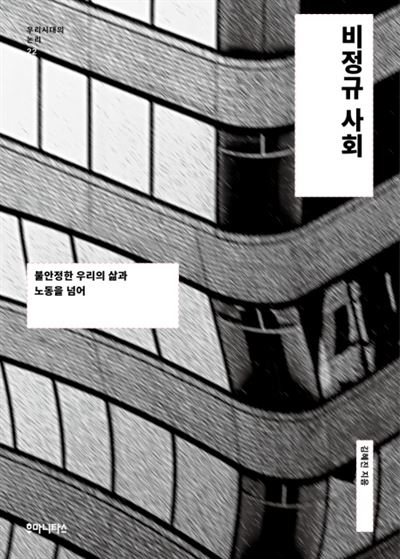
도급ㆍ파견직ㆍ일용직ㆍ계약직 단시간 노동자ㆍ무기계약직ㆍ특수고용직…. 수많은 고용형태들로 분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는 목소리는 하나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달라.” 사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도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다. 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버거운 짐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국내 한 대규모 공업단지에선 새로 노동자가 입사하면 사흘 동안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가 파견직이라서다. ‘곧 안 볼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건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 얻는 건 돈뿐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 잠깐 일하고 바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망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비정규직은 아파도 안 된다. 2013년 노동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청소ㆍ간병 노동자의 병원감염 실태와 개선 방안’을 보자. 서울대병원에서 간병 노동자의 15%, 청소 노동자의 14.3%가 환자로 인해 감염됐지만 이들의 96.1%가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주사 접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가뜩이나 임금도 적은데 보험비가 공제되면 실 수령액이 줄어들어 이들은 4대 보험 가입도 꺼린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이처럼 비정규직을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다.
파견철폐공동대책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을 거치며 15년 간 노동운동 현장을 지켜 온 운동가인 저자가 내놓는 해답은 투쟁과 연대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농성을 이어가면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자는 제안이다.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은 과격하게 들리나 “법은 불변의 정의가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악법이라면 깨뜨릴 수 있다”는 대목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정규직과도 연대를 촉구한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법이 있는 한 정규직도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이들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삼는 대신 이들과 연대해 정규직화를 위해 애써달라는 저자의 호소에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진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