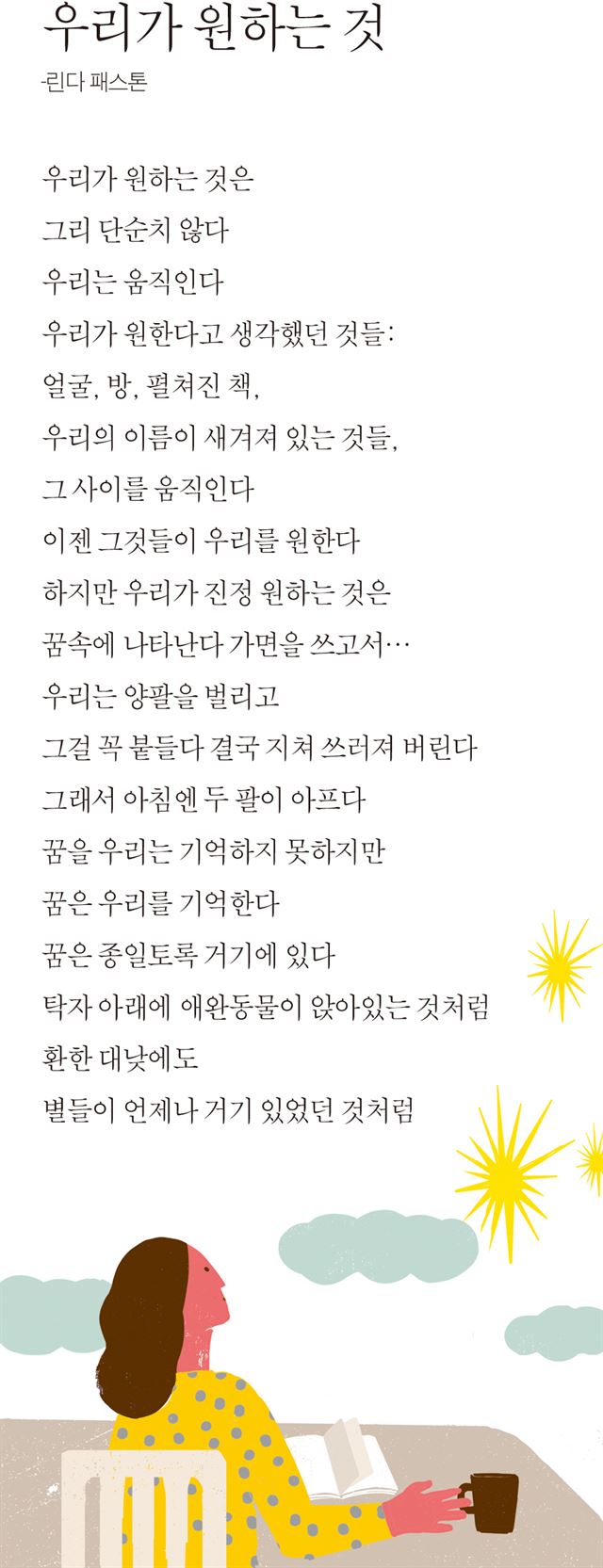
세상에서는 늘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난 세상도,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요”라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철학을 “방해 받지 않고 어떻게 욕구하며 혐오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말입니다. 욕구하는 대상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혐오하는 행동에 대해 다른 이의 비난을 받을 수야 있지만 내 욕구나 혐오감 자체를 방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인도 철학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종종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이러저러한 크기의 방들을 원하고 특정한 모습의 파트너를 원하고 특정한 책들만 즐겨 읽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의 꿈이 우리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낙관주의자 시인은 상냥하게 속삭이네요. 네 두 팔로 단번에 껴안기도 힘든 꿈이 너를 좇아다니지. 맹인을 충실하게 따라다니는 커다란 안내견처럼. 5분이라도 더 눈감고 누워서 몽롱한 기분으로 그 덩치 좋은 꿈의 희고 길고 부드러운 털들을 만져봐야겠어요.
진은영 시인ㆍ한국상담대학원대학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