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86조 7,000억원 중 국가채무는 645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0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선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재정건전성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절대적이다.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재정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의 생명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국가채무비율 40.1%는 OECD 평균치 114.6%와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점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는 실제보다 크게 축소되어 있다. 부실화되면 세금이 투입될 소지가 매우 높은 공공기관부채 등을 합산하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해야 할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이 떠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예가 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2007년말 16%로 매우 양호하였으나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2012년말 123%로 급증하였다. 이런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본격적인 복지지출이 시작단계인데다 통일비용 급증도 예상돼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재정전문가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재정은 2008년부터 9년 연속 적자이고 누적 적자 규모가 233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국가채무는 2.2배(346조원)나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144조원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무려 202조나 늘었다. 국가채무비율이 2014년 35%를 넘어선지 2년만에 40%를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내년 채무비율을 36.4%로 전망했으나 겨우 1년만에 전망이 4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관리가능범위를 벗어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유럽연합(EU)은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적자비율이 GDP 대비 0.5%를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규율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9년 연속 1% 이상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3년 연속 2%를 넘어서고 있다.
두 번째 오류는 정부가 예산 규모를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의 GDP 대비 복지비와 예산 비중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이다. 내년 조세부담률 또한 OECD 국가 평균 25.8%보다 크게 낮은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도 상실하고 있다.
해결책은 조세와 예산, 즉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진 것은 그 동안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은 약해졌는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적자는 심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규모만 줄이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정부가 전망하는 경상성장률 4.2%보다 크게 낮지만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데도 내년 국세 수입을 금년 본예산 대비 겨우 0.9%만 늘린 것 자체가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제 조세부담률의 적정화와 예산 규모 현실화를 통해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안정 성장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ㆍ건설교통부장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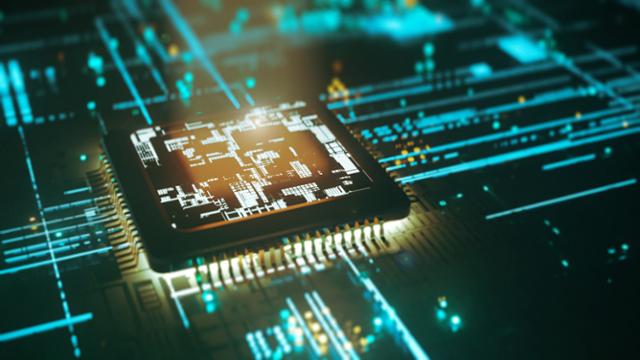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