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섭섭해.”
애인은 말했다. 그는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내게 화를 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만나려면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돼.”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또 갈아타야 그는 ‘서울’에 있는 데이트 장소로 나올 수 있다. 그는 나를 만나려면 저 먼 땅 끝 경기도에서 세 시간 전에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상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 전주와 서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서울을 가로질러 경기에 도착하는…. 그도, 나도 경기도에 산다. 서울이 한국의 노른자 땅이라면 경기도는 계란 프라이의 흰자쯤 된다. 우리는 그 프라이의 흰자 테두리 어드메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흰자에서 노른자로 당도하기까지의 거리가 한 뼘. 그리고 그 흰자 테두리에서 테두리로 맞닿는 거리가 두 뼘. 그 두 뼘을 가로지르려고 우리는 하루에 세 시간씩을 꼬박꼬박 서울에 상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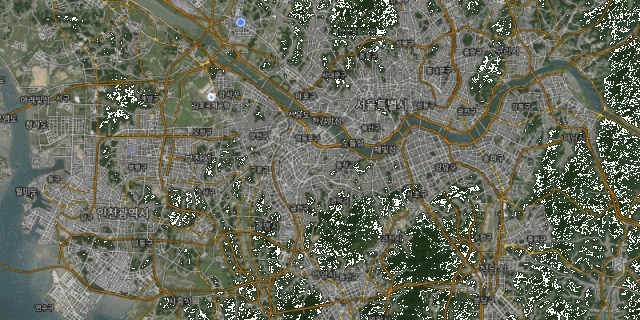
서울 살 땐 몰랐다. 서울 오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을,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인 줄 미처 몰랐다. 애인은 하루 왕복 세 시간을 길에 버리며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한다. 같이 취업 스터디를 하는 친구 둘은 각각 경기도 안양과 용인에서 서대문구를 오간다. 애인은 4시간은 집에서, 2시간은 버스에서 자는 기묘한 생활을 하고 있고, 취업 스터디를 함께 하는 두 친구는 팟캐스트랑 친구가 됐다. 스터디도, 직장도 대학도, 심지어 놀 곳조차도 ‘인서울’이 더 영양가 있다 하니 안 갈 수가 없다. 서울은 여러 의미로 노른자 땅인 것이다. 내가 서울에서 자고 깰 때는 버스 타고 길 위에서 쪽잠 자는 생활을 알 리 없었다.
경기청년유니온이 지난 25일 ‘경기도 청년 출퇴근 비용 실태조사’(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20~30대 청년 110명 대상)를 발표했는데, 경기도-서울로의 통근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46분이었다(▶ 관련기사 보기). 거리는 하루에 약 67km. 마라톤 한 코스를 완주하고도 하프 마라톤을 더 뛰는 거리다.
통근 시간이 이 정도니 삶도 고역일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오전 6시 43분에 일어나고, 오후 9시 17분에 귀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이 잦거나, 집에서 대중교통까지 보행거리가 먼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다. 일례로, 용인에 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나의 애인은 밤 10시에 회사에서 나오면 12시에 집에 도착하고 1시에야 잠자리에 든다. 일주일 5일 근무 중 평균 3일은 이런 식이다. 그리고 오전 6시에는 깨야 버스자리에 앉아서 서울로 갈 수 있다. 만성 피로가 등에 업히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나는 ‘실신’해서 출근하고 ‘실신’해서 퇴근한다고 그를 놀렸다. 경기 버스는 기절한 사람을 한 가득 싣고 서울을 오가는 통근 앰뷸런스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의 ‘탈서울’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반 이상이 경기도로 일자리를 옮기는 걸 고민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출퇴근 한다. ‘경기도 내 희망 업종이 없다’(35.1%)거나 ‘서울 직장과 경기도 직장 간에는 비전에 격차가 있다’(29.8%), ‘서울 직장이 임금수준이 높다’(13.8%)는 이유 등. 그러면 서울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방값이 얼만데.”

서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삶만 매여 있다. 아이러니한 건 서울에 겨우 방 한 칸을 마련한다고 해도 행복해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직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잦아서 애인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 방을 잡았다. 통근으로 길에 버리는 시간이 줄었으니, 삶에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서울에서 돈 주고 빌린 집이란 게 아주 작은 상자 같아서, 그 곳은 ‘집’처럼 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빨간 버스로. 노른자를 벗어나 넓게 펼쳐진 흰자의 세계로 그는 이주했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그 좁은 버스 복도에 발을 비집고 넣고 있노라면, 좌석 머리를 손바닥 꽉 차게 움켜쥐고 있노라면…. 흔들흔들 서서 소리 없는 TV 버스를 본다. 그리고 내가 앉지 못한 그 자리에 앉은 운 좋은 사람들은 무방비로 잠들어 있다. DMB 화면이 번쩍거리고, 사람들은 나무처럼 서서 잠든다.
칼럼니스트
썸머 '어슬렁, 청춘'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