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인 백무산 아홉번째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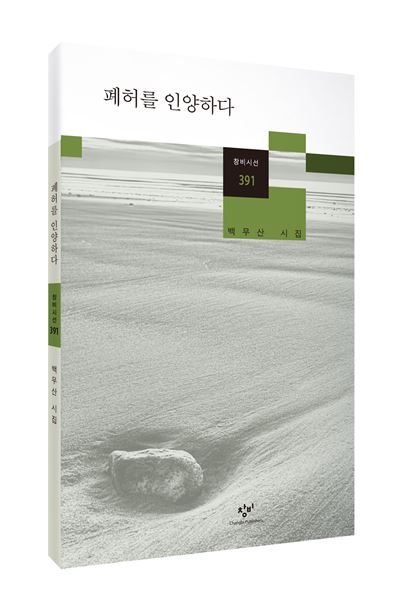
노동자 시인에서 ‘대지의 인간’으로 “문제 해결할 순 없어도 공생의 가능성 찾고 싶어”
1980년대, 시는 노동자의 언어였다. 시인이 노동자고 노동자가 시인인 시절이 있었다는 건 한국 문학사에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그 중 백무산은 당대 가장 매서운 입이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노동자 출신인 그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향해 “주인(노동자)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첫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며 호통을 쳤다.
그가 아홉 번째 시집 ‘폐허를 인양하다’(창비)를 펴냈다. 제목에서 짐작하듯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시가 여러 편이다. 사회 부조리를 향한 분노의 크기는 여전하나, 승리를 눈 앞에 둔 듯 쩌렁쩌렁했던 목소리가 간데없다. 시인은 버려진 것(세월호)에 손을 뻗는 일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져낼 이유가 없다”고 자조하고 있다.
“무엇을 인양하려는가 누구는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을 건져 올리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희망이 세상을 건져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은 희망으로 은폐된 폐허다 인양해야 할 것은 폐허다 인간의 폐허다” (‘인양’ 중)

19일 전화통화에서 시인은 인간이 진보한다는 믿음 자체에 회의를 표했다. “윤리적 정치적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인간성 혹은 삶이 진보한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하지만 현대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인지 시집엔 아나키스트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민주주의의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란 순진한 믿음이 짓밟힌 뒤, 그 위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야생 들풀이 피어나는 중이다.
“선거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만세를 부르고/노동자는 철탑에 올랐다/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노동자는 송전탑에 올랐다/선거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고/노동자는 굴뚝에 올랐다//그러나 나쁘지 않다/우리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모두 국토에 길이 들었을 것이다/우리는 대지의 인간이길 원한다” (‘대지의 인간’중)
시인은 노동과 자본의 명백한 대립이 사라진 현대를 “이기고 지는 게 없는 시대”라고 불렀다. 자본의 체제에 순응하면 생존하고, 불응하면 배제된다. 그는 배제란 단어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과거가 개인을 탄압했다면 현대는 개인을 배제합니다. 배제했다는 건 체제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죠. 그건 역설적이게도 체제순응적 인간이 아닌, 인간성을 잃지 않은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배제된 것들, 버려진 것들에 대한 시인의 시선은 각별하다. 세월호 유족과 노동자, 촌로, 걸인, 청년들에 대한 성의 있는 응시가 곳곳에서 목격된다. 시대가 변한만큼 시인도 바뀌었다. 올해 환갑을 맞은 그는 “특별한 일 없이 가끔 시민단체 들락이며 산다”면서 웃었다. “이전엔 사회 변화를 통해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많이 놓쳤죠. 그러나 국가 체제 안에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슬픔에 좀더 눈이 갑니다. 고통을 해결해줄 순 없어도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찾고 싶습니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