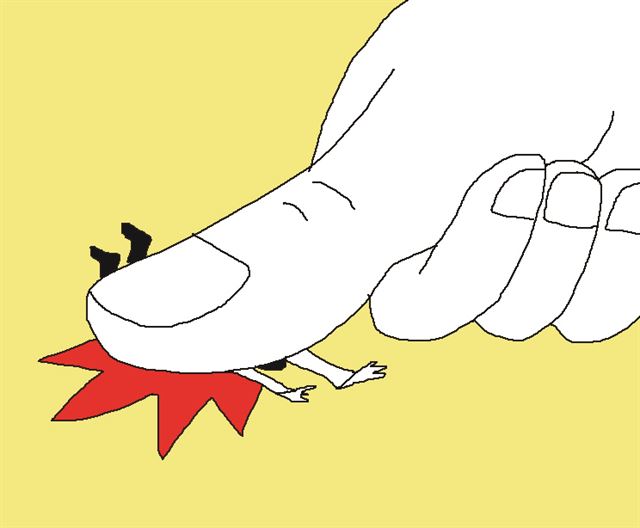
갈수록 과격해지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주장이 번지고 있다. 마냥 수위가 높아져가는 혐오 표현들이 자정기능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섬세하지 않은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의 ‘공공질서법’,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을 비롯, 총16개국에서 인종과 종교 등을 근거로 한 혐오 표현에 형사 처벌을 법제화했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우려해 입법적인 규제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자율적 규제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각 대학이나 회사 등에서 ‘표현 강령’을 제정토록 권고하거나 차별 시정 기구를 통한 민사배상 제도를 정비하는 식이다. 사법적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혐오 표현에 대한 무제한적 관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성별을 상습적으로 비하ㆍ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개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선 2013년에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인종 또는 출생지역을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내용의 ‘혐오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사법적 규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 일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북, 빨갱이와 같은 혐오 표현은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에 기여하기보다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측면이 크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오표현과 단순 의견 개진을 구분하는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한 “혐오 표현 규제가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의 반대자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심윤지 인턴기자(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4)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