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광복절은 삼일절과 더불어 ‘이견이 없는’ 날이었다.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고유한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였다는 데 누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 TV는 매년 식민지 시대의 영웅들에 대한 특집 드라마를 편성했다. 일본이라는 ‘사우론’에 맞서 싸우던 독립투사들이 승리를 쟁취하는 동안, 이에 절망한 친일부역자들은 ‘사루만’의 표정을 지으며 죽거나 참회했다.
해방이 역사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건, 좀 더 나이를 먹어 알게 됐다. 해방 공간은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 악마의 잔칫상 같은 혼란이었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 많은 명망가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암살과 월북 등으로 이후 남한 사회의 시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업적과 국제적인 평가에 있어서 김구와 이승만에 못지 않았던 여운형도 그들 중 하나였다. 유년 시절에 교육받은 해방이 ‘반지의 제왕’이었다면, 학자들의 역사책 속에 나타난 해방 후 역사는 ‘왕좌의 게임’이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를 이용한 정치적 행보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주로 보수를 자임하면서 동시에 높은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이다. 그 중 언론에 인용된 여당 대표와 공영 이사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기 때문에 매우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옳다. 1948년 이전 역사에는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위안부의 고초가 있었고 광복군의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국과, 이를 주도한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은 옳다. 더욱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같은 주장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이 주장이 결과의 상태를 보고 과정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오류(historical fallacy)’라는 점이다. 해방 공간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과 평가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주장이 가상의 공포를 동원해 스스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포의 연대는 현재 하나의 이념 공동체로 발전하는 중이다.
여당 대표의 건국 발걸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개최된 개신교 예배로 이어졌다. ‘해방 70년 광복절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라는 행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국이 광복으로 승격된 자리였다. 축사를 한 목사들 가운데에는 “이승만을 부정하는 건 메르스 같은 평양식 역사관”이라고 주장해온 이도 끼어 있었다. 이들의 영적 전쟁은 네오마르크시즘에 입각한 동성애와 한국 침투를 획책하는 이슬람교에까지 확전되는 중이다. 이들이 여권에 보내는 정치적 지지는 마른 여름 매미 소리만큼 확고하다. 여당의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의 개신교 신자 국회의원, 여당이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들이 집회와 언론을 통해 동조의 세기를 키워가고 있다.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북한의 블럭들을 촘촘히 쌓아 맨 위에 건국 대통령의 초상을 올리는 중이다.
역사에 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환영해야 한다. 이는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정신이다.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설사 잘못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 토론장에 회부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1644년 존 밀턴이 쓴 ‘아레오파지티카’를 인용한다. 여기서 밀턴은 틀린 주장조차도 “진실과 충돌하게 되면 진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남의 잔칫집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건, 우리 사회에 역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사실의 추궁과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양식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일본 망명 타진설을 보도한 KBS 직원들이 집단으로 인사 조치되었다. 이 같은 공영방송의 현실 앞에서 이사장이 자랑스러워하는 건국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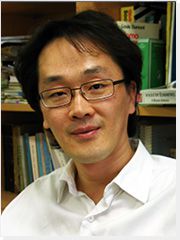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