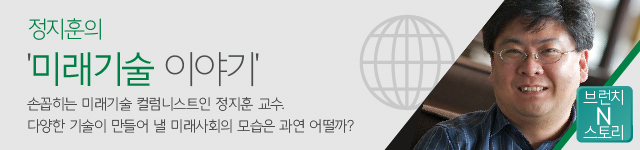
요즘 셰프테이너들이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설화(?)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 잘 나가는 한 셰프테이너에 대해 다른 셰프가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때 이 셰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서양음식을 배우려면 그 지역에 가서 본토 사람들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더 잘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서양음식을 공부하면 런던에서 한식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 (중략) ‘분자요리’에 도전하기도 하고…”
여기서 언급한 ‘분자요리’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인기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위에서 이야기를 한 셰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리라는 것은 무척이나 우아하고,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지고 셰프라고 하지 말라.”
비슷한 이야기로 최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백종원 씨의 요리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본다. (▶ '악식' 황선생의 쓴소리 "미식은 거짓말이야")예술가나 전문가 집단, 권위를 정통으로 취득한 집단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종의 B급(?)에 대해 경계와 무시를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례 말고도 부지기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위에서 언급한 ‘분자요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일까? ‘분자요리’에 대해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분자요리학은 음식의 질감과 조직, 요리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맛과 질감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분자 요리학은 조리과정 중 물리적,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과학적, 예술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옥스포드의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와 INRA의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 티스가 '분자 물리 요리학'(Molecular and Physical Gastronomy)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고, 이는 1998년 쿠르티가 사망한 뒤로 조금 더 간결한 용어인 '분자 요리학'(Molecular gastronomy)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미래기술을 주로 다루는 필자가 이 주제를 이번 주에 선택한 것도 이것이 정말로 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는 하버드 대학의 ‘과학과 요리(Science and Cooking)’ 라는 10주 과정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이 과목을 이끌고 있는 담당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응용수학과, 물리학과 등 요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과학을 전공한 교수들과 수 많은 셰프들이 함께 한다.
매주 비디오 강의와 숙제, 그리고 실제 키친에서 할 수 있는 실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진행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다. 처음에는 셰프들이 나와서 해당 요리기법과 관련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그리고, 그 요리에 대해 과학자들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방식과 맛 등의 과학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다시 셰프들이 등장해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요리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하거나, 새로운 시범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완전히 다른 것을 공부한 전문가들이지만 이들의 호흡은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아래 공유하는 영상은 이 강의 중에서 유튜브에 공유된 "음식과 과학"의 역사에 대한 해롤드 맥기(Harold McGee)의 강연 중 일부다. 비록 영어 강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기 바란다.
이 강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다양한 이론과 실기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주차의 주제는 ‘에너지와 온도, 열’ 인데, 뉴욕의 유명한 바인 부커앤닥스(Booker and Dax)의 오너 셰프 데이브 아놀드(Dave Arnold)가 직접 요리 시범을 보여 주고, 요리 실험과 그 원리를 설명한다. 이어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 이론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세션이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는 비열(specific heat)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달걀이 물과 쇠고기의 중간 정도의 비열을 가지며, 달걀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어서 이들이 각각 62도에서 70도 사이의 각기 다른 온도에서 익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 또한, 액체질소를 이용한 차가운 음식을 만들 때에도 레몬 등과 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재료는 비열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지만, 마쉬멜로우처럼 비열이 낮은 음식은 액체질소에 담갔다가 바로 입에 넣어서 먹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서 독특한 식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래의 영상은 액체질소 요리법과 관련한 과학자와 셰프의 합작강의다.
위의 영상에서 아놀드와 같은 셰프가 액체질소를 자신의 손 위에 부으면서 기화된 질소가 액체질소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라이덴프로스트 효과(Leidenfrost effect)를 설명하는 장면은 셰프와 과학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요리는 과학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언어학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댄 주래프스키가 쓴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요리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6세기 페르시아 사산왕조의 샤가 가장 좋아했던 시큼하고 달큼한 육류스튜였던 시크바즈가 중국을 다니던 선원들에 의해 10세기 생선요리(밀가루를 묻혀 튀긴 생선에 식초와 꿀과 향신료로 만든 소스를 뿌린 요리)가 되었다가, 지중해를 건너 시칠리아에서 ‘스키베치’, 나폴리에서 ‘스케페체’, 프랑스 브로방스에서는 ‘스카베그’,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에스카베츠’ 또는 ‘에스카베체’가 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덴푸라’, 페루의 ‘세비체’, 영국의 ‘피시앤드칩스’와 같은 각국의 전통음식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어떤 문화도 고립된 섬은 아니며, 문화와 민족과 종교 사이의 혼란스럽고 골치 아픈 경계에서 어떤 훌륭한 특성이 창조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사례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과 수백 년 전에는 그 재료조차 우리 땅에서 없었던 것들이 많고, 이는 요리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 프랑스 요리나 중국, 일본 요리의 상당 수도 마찬가지다.
정통 요리를 배운 셰프들을 깎아 내리고자 함이 아니다. 애초에 요리라는 것은 고립되어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실험과 교류, 그리고 개방된 마음가짐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같이 발전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문이나 사회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다. 학위나 자격증, 전통을 따르는 것 등 뭔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융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개방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최현석 셰프나 백종원 사장의 요리철학이나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것이 반갑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요리가 더욱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정지훈 '미래기술 이야기' ▶ 시리즈 모아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